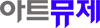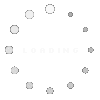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2024-03-28 | 작가 노트_내 그림방이 있는 어우실은 아직도 현대판 동막골이다 |
작가 노트
내 그림방이 있는 어우실은 아직도 현대판 동막골이다. 자동차나 두발로 걷지 않으면 바깥세상과 접할 수 없는 오지 아닌 오지다. 왜? 나는 ‘가지 않는 길’을 굳이 가고자 그 화두를 붙들고 끊임없는 사유를 하는 것인가? What?!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만이 바로 가는 길인가? 많은 의문을 품은 체 새로운 것을 찾아 사유하고 또 사유한다. 가공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자연이 나에게 주는 감성은 무한하고 두렵기도 하다. 수시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우주는 희로애락의 예술적 감성을 무제한으로 던진다. 이런 이야기 거리를 담기위해 내 안의 것 들을 덜어내는 연습을 무한히 한다.
덜어내는 연습이란 그리다만 캔버스 그림을 흰색으로 덮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길가다가 멈춰선 나그네처럼 붓질이 멈춰질 때면 쉼표를 찍고 한참을 쉬면 나아질 그런 일은 아니다. 나는 자연의 모습을 자연 그대로 상처 나지 않게 캔버스로 옮기는 것은 지금의 나보다 자연과 아무런 거래 없이 크레용으로 그려내던 어린 아이의 시절로 회귀하고 싶다. 50년 전 보다 더 오래된 기억으로 회귀해 보면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같은 손등으로 쳐대던 종이딱지와 가을하늘에 날던 종이비행기가 주마등처럼 되살아난다. 사각 캔버스 안에서 흐르는 물길 따라 구불구불 흘러가는 종이배에 묵은 시간을 띄워 보내고 뒤집혀 넘어지는 종이딱지에서 소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담는다.
들길을 걸으며 딸아이의 다섯 손가락에 끼워진 고추잠자리를 가을 푸른 하늘에 날려 올린다. 딸아이 손에서 날아오르는 고추잠자리에서 자유 곡선을, 붓꽃에 앉은 노랑나비에서 바람 길을 본다. 여름철 폭우로 쏟아지는 장대비에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듣고, 가을날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마른 나뭇잎에선 카잘스가 연주하는 슈만의 첼로 선율을 캔버스에 담는다. 내 아리랑은 한반도 땅 끝 마을 진도의 울림이기도 하고 드볼작의 ‘신세계’에서 오는 서방세계의 색채이기도 하다. 하짓날 아침 동막골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르는 강렬한 태양의 에너지와 가을 저녁 무렵 저수지에 걸려 넘어가는 붉은 석양 노을의 빛깔을 예술이란 이유로 어찌 범접할 수 있을 것인가? 화구와 채색이란 수단을 빌어 동막골에서 일어나는 하루의 일상을 정해진 사각 프레임 안에 나는 에세이처럼 담는다.
‘0’과 ‘1’ 사이를 재깍재깍 돌아가는 IT란 지금에 나만이라도 편한 생각을 담고 싶고 딸아이 일기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동막골의 내일 이야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장편소설을 쓰는 작가처럼 나는 생각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한장 한장 낱장을 더해갈 뿐이다. |
|
| 2024-03-28 | 백종환 작가 일지 |
백종환 작가 일지.
소리에 색을 입히다. 가공되지 않은 사물을 좋아하는 나의 습성으로 원초적인 자연과 그 구성원 들을 나의 작업 소재로 삼는다. 원래의 모습에서 출발이 창작의 본류라 생각되어 자연에서 만나는 수많은 objects의 특성과 그들만의 소리를 찾아내어서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한다.
내가 좋아 하는 소재를 찾아 동막골 같은 어우실 동네에 2005년에 이사와 작업을 한다. 하루가 거의 진공 상태 같은 산 아래 터이다.
진공 같은 무 잡음 공간에서도 소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제된 사물의 소리가 각자의 색을 띈 채 또렷하게 들려 온다.
바람 ,새, 물, 산, 들짐승, 바위 등. 전혀 중복되거나 모방 할 수 없는 유일한 순수음을 발산하고 나는 거기에서 색을 찾는다.
내가 선택한 사물의 소리에 대한 갖가지 색들은 그 대상들의 해답이 아니라 또 다른 소리들을 제시 할 것이다.
함박눈이 쌓이는 소리를 문자로 무어라 적을 것인가. 가을에 낙엽이 구르는 소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렇듯 자연의 사물에서 들리는 소리는 문자로 기록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에 맞는 색을 입혀 내는 것이 사물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서물과 형체 그리고 색이 만나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억이 소리를 담은 그림으로 기록되어 진다.
2019년 |
|
ARTIST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