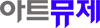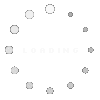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풍경을 정물로 변주한 ‘환상 바다’ – 라메시스(Lamesis), 김성호(미술평론가) | |
풍경을 정물로 변주한 ‘환상 바다’ – 라메시스(Lamesis) 김성호(Sung-Ho KIM, 미술평론가)
작가 창남은 이번 전시의 주제로 ‘라메시스(Lamesis)’를 내세웠다. 이것은 그녀가 불어로 바다를 뜻하는 ‘라 메르(La mer)’와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모방이라는 의미의 ‘라 미메시스(La mimèsis)’를 혼성해 만든 사전에 없는 단어이다. 이 혼성어는 이번 전시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창남이 이번 전시에서 ‘바다’ 이미지를 닮은 꼴로 ‘모방’하되 단순한 외관의 재현이 아닌 작가 내면의 기억과 감성이 교류하는 환상의 이미지로 변환하여 선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창남의 라메시스 연작을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의 바다’로 부르기로 한다. 이 작명이 이미지(image)의 고대 그리스 어원인 ‘판타스마(φάντασμα)’에 ‘고리아’가 붙어 초현실적 이미지인 환영상(幻影像)을 지칭하는 만큼, ‘환영 혹은 환상의 바다’라고 할 만하다. 최근작은 작가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 필터 삽입과 노출 조정으로 바다를 환상적인 색상의 이미지로 포착했던 이전의 바다 연작을 메이킹 포토(making photo)의 방식으로 계승, 변주한 것이다. 창남의 사진 창작 과정을 추적해 보자. 그녀는 흔히 시폰(chiffon)으로 불리는 얇고 부드러운 천을 걸어 바닥까지 드리우고 천의 뒤편에서 이전에 선보였던 바다 연작에서 추출한 색과 이미지를 프로젝터로 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모래를 깔고 불가사리, 조개, 소라껍데기, 갈매기를 연상하게 하는 새의 깃털을 얹어 마치 바닷가처럼 꾸민 다음, 이것을 다시 촬영한다. 메이킹 포토의 일차 단계인 셈이다. 이후 컴퓨터에서 디지털 파일을 불러와 다시 미세한 후속 작업을 거치고 인화하는 이차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그녀의 메이킹 포토는 완성된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남이 메이킹 포토의 일차 단계로 삼아 연출한 연극 무대와 같은 장치에 관한 것이다. 스튜디오에서 정물을 촬영하기 위해 배치한 테이블과 자연스러움을 한껏 치장한 주름지게 만든 천, 그 위에 중심을 잡도록 배치한 주요 오브제와 드문드문 놓은 부수적 오브제들과 같은 장치는 메이킹 포토에 있어서 일차적 필수 연출이다. 그녀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다의 풍경(paysage)을 스튜디오로 가져와 정물(nature morte)로 전환하고 전유한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이 과일이나 꽃뿐만 아니라 해골, 뼛조각, 모래시계, 거울, 꺼진 촛불을 알레고리의 대상으로 삼아 인생을 은유하는 바니타스(Vanitas) 정물화에 천착했다고 한다면, 창남의 이 바다 사진 연작은 시폰, 모래, 영상 프로젝션을 통해 정물화나 정물 사진의 형식을 차용하면서도 삶에 관한 교훈을 전제하는 알레고리보다는 “밖에서 내면으로 들어온 관념적 풍경”을 선보이는 데 더욱더 집중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창남은 이전 연작에서 두려울 만치 변화무쌍한 바다로부터 대자연의 ‘숭고 이미지’를 얻기 위해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파도와 대면하는 오랜 노동과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작에서는 그 숭고의 풍경 이미지를 자가 경험 속 기억과 회상을 통해 ‘안온한 정물 이미지’로 치환한다. 특히 시뮬라크르로서의 ‘명백한 가짜 바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물결과 파도처럼 늘어뜨린 시폰의 주름 잡기와 그 위에 투사한 선명한 색의 바다 사진 그리고 고의로 어설프게 꾸민 해변의 연출 방식은 그녀가 지향하는 ‘밖에서 내면으로 들어온 관념적 풍경’를 극대화하기에 족하다. 그런데 밖에서 내면으로 들어오다니? 그것은 숭고의 풍경에서 안온한 정물로, 실사를 나간 야외에서 메이킹 포토의 실내로 그리고 현실의 ‘실재’에서 관념이라는 ‘비실재’로 이동하는 창작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이동과 전환의 건널목에는 기억과 회상이라는 주요 화두가 존재한다. 창남은 바다 풍경을 연출한 일련의 연극적 장치를 통해서 기억이 소환하는 요나 콤플렉스(jonah complex)의 미학을 오버랩시킨다. 그것은 부정의 개념이 아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서랍, 박스, 장롱, 구석, 조개, 집’과 같은 ‘감쌈의 공간’이 전하는 안온하고 편안한 공간을 설명하는 메타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구약성서의 등장인물인 ‘요나가 거주했던 고래뱃속’이 처음에는 공포의 공간이었으나 점차 안온한 공간으로 바뀐 어떠한 전환의 과정을 내포한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의 공간에는 강력하고도 원초적인 긍정의 기억을 함유한다. 마치 우리의 무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인 ‘어머니의 자궁 속 모습’처럼 말이다. 창남은 바닥의 모래와 늘어뜨린 시폰이 구획하는 수평과 수직의 공간 그리고 천 주름,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상의 프로젝션과 같은 연출을 통해 ‘바다’를 두려운 숭고의 대자연에서 안온한 감쌈의 공간으로 전환하면서 요나 콤플렉스의 미학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간을 다시 최종적으로 카메라로 포착하는 바다 연작은 바다라는 실재에 대한 작가만의 기억이 확장하는 비실재적 풍경이 된다. 그것은 불완전하지만, 환상적인 관념 풍경이 된다. 이번 전시 라메시스에서 창남은 바다라는 풍경을 정물로 변주한 환상의 관념 풍경을 선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창남의 이번 전시를 메이킹 포토와 기억으로 소환한 ‘환상 바다’ 라는 의미의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의 바다’ 혹은 ‘액자 속 액자 소설’을 사진으로 시도한 ‘여러 폭의 마인드스케이프(mindscape)’라고 부를만하다. 그 안에서 관객이 할 일이란 무엇일까? 도시 속으로 소환한 바다 풍경 앞에서, 프랑스 작가 빅토르 푸르넬(Victor Fournel)의 언급처럼 ‘산보하는 사람(flâneur)’이 되어 스스로 ‘움직이는 사진’이 되어 보면 어떨까? (20231126) |
|
| 라메시스(Lamesis) | |
라메시스(Lamesis)
‘라메시스(Lamesis)’는 바다를 뜻하는 프랑스어 ‘라 메르(La mer)’와 고대 그리스어로부터 유래한 모방이라는 의미의 ‘라 미메시스(La mimèsis)’를 섞어 내가 임의로 만든 말입니다.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단어지만 두 개의 단어가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로 연결됩니다. 즉 내 작품에서 ‘바다’와 같은 이미지와 그것이 가리키는 ‘모방’이라는 텍스트와 연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품에서 바다는 대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채 시각적 닮음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이미지입니다. 나는 유사함 또는 닮음을 강조하여 오해와 착각을 유도하기보다는 밖에서 내면으로 들어온 관념적 풍경을 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나의 의도는 바다에 대한 기억과 회상으로 더 확장된 비실재적 풍경을 만들어 냅니다.
각 개인은 바다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각기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진 나는 감정 몰입을 통해 바다를 새롭게 보고자 합니다. 바다는 나에게 자아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바다는 현실에서 불편하거나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며, 내면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바다와 만나는 순간은 일종의 정화를 경험하게 되며, 어린 시절 어두운 다락방에서 느낀 공포가 서서히 안정과 평온으로 변하는 요나 콤플렉스(jonah complex)와 비슷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나의 작업에서 이런 감정의 파편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왜곡되며, 관객을 익숙하고도 낯선 풍경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과장된 파스텔 톤의 색상, 비현실적인 거리감, 시폰으로 위장한 파도 등은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색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바다에 대한 외형적 닮음에서의 유사성을 반영하는 한편, 나의 내면적 기억과 상상이 결합한 새로운 바다 풍경을 보여 줍니다.
|
|
| 여기 캔버스에 파스텔 톤의 색을 올리고_유근호(평론) | |
여기 캔버스에 파스텔 톤의 색을 올리고, 혹여 붓질이라도 드러날까 노심초사 곱게 정성 들인, 다소 몽환적인 화면이 있다. 저것이 무엇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대상은 알아보기 힘들다. 조용하다 못해 적요하다. 캔버스의 결에 잠시 눈이 홀려 그림이라 착각할 수도 있는 창남의 작품은 작가의 내면과 대자연의 극한 대치이자 종국에는 화해의 조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다. 보기에 따라 이미지를 최대한 제거한 감각적인 실험성의 사진을 의식한 듯한 이 작품들은 의외로 ‘찍는다’는 사진의 기본적 함의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실제로 창남의 앵글이 대상을 포착하는 순간은 우리가 바라보는 잔잔한 화면과는 엄청난 기후적, 생리적 거리가 있다. 정(靜)과 동(動)의 불일치이자 동시에 일치가 발생한다. 작가는 폭풍우와 비바람, 아니면 눈보라와 파도가 포효하는 바다와 대면할 뿐 아니라 카메라와 작가 자신 그리고 대자연의 웅장함 풍광 사이에 위치하며 앵글을 갈무리해야 한다. 이 갈무리는 작가와 대상 사이의 정화다. 의미론적으로는 작가와 빛 사이다. 무릇 사진은 빛이다. 하지만 인지적 측면에서 작가에게는 보는 대상의 색과 거기에서 반사되는 빛의 파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닭에 그의 작품은 앵글의 자치적인 폐쇄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작가와 자연 대상의 통합된 구조, 즉 조응의 결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조응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잔잔한 화면이 앗아갔던 소리, 비와 눈 그리고 파도를 부르는 바람의 격한 소리를 들으면서 작가의 체취(mhc)를 말을 수 있을 것이다. - 유근호(평론)
|
|
ARTIST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