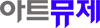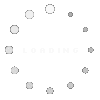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동우(東隅) 최돈상의 서예 작품세계 | |
동문동지(同門同志) 붕우(朋友)가 보는 동우(東隅)의 작품세계 차고 이지러지는 달의 모습이야 인간사를 벗어난 천상의 조화지만, 유난히 휘영청 밝은 가을달이 보는 이의 마음에 허전하면서 맑은 그림자를 남기는 것은 높은 하늘에 텅 빈 충만함을 선사하기 때문이리라. 천상의 비움이 그렇게 한 것이다. 덩달아 마음이 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경(明鏡)을 보듯 달을 보면서 청정무구(淸淨無垢)에 무아무심(無我無心)의 세계에 빠져보고 싶은 때다. 빗자루를 든 한산(寒山)의 모습과 책을 펴든 습득(拾得)의 모습의 그림이 어찌 그렇게 천연스럽게 보여 비길 데 없는 듯 어울리는 계절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땅에 발을 딛고 달을 쳐다보며 걸어가는 나의 벗 동우(東隅)가 전시회를 연다. 두 번째 개인전이다. 기대에 마음 설레고 기쁨에 몸 둘 데 어딘지 찾기 어렵다. 가끔 있는 술자리에서 전시회에 대해 말을 나누다가 나에게 소견을 말해주기를 떠맡기니 천학비재(淺學菲才)한 친구가 혹시 천박하고 치졸(稚拙)한 몇 마디 글로 심혈을 기울인 역작들에 거추없는 일이나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며, 우정을 이어온 지난 세월을 핑계 삼아 두서를 찾지 않고 손끝에 맡기려 한다. 오랫동안 너무 가까이에서 봐온 지라 새삼스러운 생각도 들고, 글을 쓴다한들 무슨 신선한 활기를 일으킬만한 능력도 부족하다. 다만 서론(書論)공부로 책을 읽으며 수긍이 가는 부분과, 역대 저명서예가들의 일언(一言)을 이해하려 애쓴 소박한 담론을 적고자 한다. 30년을 넘은 집필(執筆)의 행로(行路)에서 동우는 필력의 수준을 인정받았고, 그동안 출품했던 많은 전시회를 통해 제가(諸家)들의 소견을 너무 많이 들어왔으며, 또한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소회(所懷)를 가끔 피력(披瀝)하곤 했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평론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앞선 대가(大家)들의 일언반구(一言半句)나 평론가들의 평보다 더 선도적인 일설(一說)을 구사할 자질이 부족함을 알기에, 일목요연한 서평보다는 술잔을 앞에 두고 담론을 주고받았던 서법의 한 대목이나, 작품구상의 골격을 이루는 심미관, 그가 피력하고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상의 대강을 기억을 더듬어서 서법이론가들과 사상가들에 기대어 다시 들추어보고, 나 또한 부족한 공부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일단의 서평(書評)을 했던 분들에게는 인용한 부분에 대해 양해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필묵여정(筆墨旅程)의 출발 동우와 만난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다. 스무 살이었던 1979년 봄바람이 교정의 잔디 위를 스칠 때 대학 서예동아리 전남대학교묵향회의 신입생으로 처음 만나, 풍진세상에 나와 지천명(知天命)에 이른 가을바람을 맞고 있으니, 참으로 세월의 속절없음을 느낄 만도 하다. 그동안 같이 붓을 잡기 시작해서 군 복무 시절을 제외하면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이 지내왔으니 서로 다른 성격과 취향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일상적 습관에서부터 고상한 취미, 인간적 고뇌, 인간성에 이르기까지 이해하는 한계가 범배(凡輩)가 추측하는 정도는 넘는다 할 것이다. 서예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법한 공과대학에 다니면서 함께 공부하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토론하고, 서로 집을 왕래하며 지내왔던 시간은 가족들의 꾸지람이 어지간히 있을 정도였다. 후배,동료들과 함께 라면으로 한 끼니를 채우고 밤을 지새우며 글씨를 쓰면서 보냈던 날도 꽤 많았다. 지금도 다시 만나 글씨를 쓰는 친구들이 있고(일곡 김재승, 동촌 심응섭), 당시 학생 신분으로 입상하기에 쉽지 않았던 전라남도미술대전에 함께 입선한 경험도 있다. 선배였던 양전 김원익의 지도를 받으면서 처음 취미로 시작했던 서예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한 학서(學書)의 초기에는 구양순의 구성궁예천명과 황산곡의 행서, 왕희지 행서를 공부했고,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취미로 하더라도 깊은 뜻을 얻고, 안목을 높이고자하는 그의 철저함 때문에 학정 이돈흥(鶴亭 李敦興)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것은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학창시절에 사랑을 키워 결혼한 부인(김금자)과 큰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채 2년도 안 된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서예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겼다. 첩첩산중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 서있는 듯싶은데 어떻게 산을 넘고, 무엇을 할 것인 지가 육감적으로 다가와, 서예가 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회고한다. 동우가 가장 가까이서 생각을 키우고 철저하게 정신을 집중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는 부모님과 부인의 도움이다. 군복무를 하시다가 중령으로 예편하시고 매사 철저한 생활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아버지, 자상하면서도 강단(剛斷)있으시고 세심한 솜씨를 지니신 어머니, 묵묵히 가정사의 어려움을 떠맡아,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 별처럼 자리를 지키며 내조하는 부인이 있어, 학서(學書)의 어렵고 험난한 길을 꿋꿋이 헤치고 넘어야 하는 정신적 자질과 의지의 바탕을 닦았다고 생각한다.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겐 의리와 정의, 노력, 겸양과 예의를 실천하고, 부모님께는 지극한 효성을 다했다. 지금도 동우가 심성(心性)에 대한 수양에 꾸준하고, 스스로 즐겨 자주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말할 때도 심성이 청아(淸雅)하고 고매(高邁)한 사람들을 찾는다고 느낀다. 꼭 서예가만이 인품의 바탕을 닦고 기르며 도덕적 덕목을 요구해 수양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없지만, 천성(天性)에 있어서는 품부(稟賦)의 다소(多少)가 있음을 느낀다. 당연히 품성이 열등하면 배우는 데 제한을 받으며 입문(入門)이 쉽지 않는 것이다. 동우의 정신적 자질과 의지의 바탕을 닦은 것과 청아하고 고매한 심성의 추구는 서예에서 기질(氣質)의 발휘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것은 서예의 작품에서 풍격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풍격(風格)은 사람을 대할 때 얼굴과 몸에서 풍기는 인상과 흡사해서 딱히 잴 수 없지만 분명히 보이는 것이다. 심작철(沈作喆)은 《우간논서(寓簡論書)》에서 말했다. 그 옛날 현인들이 아첨꾼의 묵적을 보고 사람의 눈이 부릅뜨고 보는 것과 흘겨보는 자태가 있어서 남의 약점을 밝혀 놓을까봐 무서워서 가까이 못하겠다고 했다. 내가 안진경의 서예를 보면 늠름하길 정색(正色)을 가졌으며 마치 조정에서 정직한 언론을 직언하는 것이 하늘의 위험도 굴복시키는 것 같았다(昔賢謂見臼人書跡 人眼便有万棅側媚之態 惟恐其許人不可近也 予觀顔平原書凜凜正色 如在廊廟直言 居論 天威不能屈). 사람 마음의 귀천(貴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한묵(翰墨)도 사람과 비슷하다. 심성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흔적 학정선생님께 입문하여 여러 서체의 정수(精髓)와 운필(運筆)을 공부하다가, 1991년 서예연구실을 마련하고 더욱 정진하면서 많은 습작들을 발표하는 전시회를 가졌었고, 번번이 굳센 골법용필(骨法用筆)을 바탕으로 서예의 공간미(空間美), 조화미(調和美)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시대성(時代性), 한국성(韓國性)에 대한 고민과 정신의 축적에 대한 것들이 염두(念頭)의 적소(適所)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통서법의 핵심들을 발견하고 연마하며, 깨닫기 시작한 30대 연서(硏書) 시기라고 여겨진다. 주목할 만한 작품들은 한국서예청년작가전과 향덕서학회전, 연우회전, 한중서법교류전 등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 백악미술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그동안 연구하고 실험한 전통서법에 대해 실력을 쌓은 서예가들의 고견도 들어보고 세상과 소통(疏通)해보려는 의도였다. 나석 손병철(羅石 孫炳哲)선생은 나중에 고봉이선경서전 서평에서 언급하며 파격미(破格美)나 실험적 현대성을 내보이는 작품의 성향이었다 고 비교 평했다(2002년 월간서예 1월호-21세기 광주서맥의 새로운 가능성). 동우는 늘 일정기간의 수련이 지나면 정리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리란 게 고전을 통한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면 창작성을 가진 작품을 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변화 라는 예술가의 주요 사색의 주제를 이끌고, 변화를 순간순간 예술가의 미래에 대한 통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전시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일찍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든 경험은 하나의 아침, 그것을 통해 미지의 세계는 밝아 온다. 경험을 쌓아 올린 사람은 점쟁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경험이 쌓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우칠수록 감정을 억제하는 법이다. 경험이 토대가 되지 않은 사색가의 교훈은 허무한 것이다. 고 했다. 첫 번째 전시회가 있었고 이듬해 1997년 동우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에 입학해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무슨 학위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예술 전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40대에 펼쳐 보고 싶은 서예에 밑천을 마련코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가 주로 예술사(藝術史)와 동양예술철학을 두루 공부하면서 노장사상(老莊思想)에 침지(浸漬)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부터 5년여 서우(書友)들과 사서(四書)를 익혔으며, 꾸준히 한시에 관한 공부도 병행하였다.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전시회를 열고자 했으나, 삼우전(예송 강덕원, 고봉 이선경, 동우 최돈상, 2004년 3월 백악미술관)의 약속이 있어서 두 번째 전시회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가 골법용필(骨法用筆)과 동시에 험절(險絶)의 결구(結構), 필세(筆勢)의 방종(放縱), 새로운 장법(章法)에 대한 시도를 선보인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삼우전에서 스승인 학정 선생은 서(書)를 통해 만났지만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유수부쟁선(流水不爭先)의 경지에 와 있으니 흐뭇할 뿐이다 고 하였다. 쉬지 않고 생각하고 도전해야 꺼리가 만들어지는 법이니, 이러한 노력들이 돋보여 지금 발행되고 있는 월간 서예전문지 「묵가(墨家)」의 전신인 월간 「까마」에서 특집으로 조망한 미래 한국서단의 주역이 될 작가에 선정된 바 있다. 대가망(大家望)이란 이름으로 조명하는 특집란(2005년 까마 2월호)에서 동우는 스스로 서법예술의 전반에 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법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다방면으로 피력하고 있다. 또 대담과 평론을 한 김정환은 동우 최돈상씨는 특정한 형태로 굳어진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서는 작가다. 그러한 노력과 시도야 말로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자 예술가의 전제조건이 아닐까 라고 평하였다. 1995년 1월에는 삼문전(三門展, 하석 박원규, 소헌 정도준, 학정 이돈흥 선생 문하)이 열렸는데, 동우는 행초서 8곡 병풍을 출품하였다. 자유로운 운필이 돋보이는 작품이었고,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했건 안 했건 필세(筆勢)의 방종에 뜻을 둔 한간(漢簡)의 필의(筆意)가 흠씬 풍기는 것이었다. 동우는 스스로 글씨를 대중음악의 한 형식인 록에 비유하였는데 이 무렵이 대체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로 여겨진다. 김병기 선생은 삼문전의 평(2005년 까마 2월호)에서 모처럼 만에 시원한 작품을 보았다. 역시 기량이 있는 작가는 다르다. 실컷 놀라고 판을 벌려 주면 응당 신나게 놀아야 한다. 잘 노는 사람은 벌어진 판 앞에서 망설임이 없이 신나게 논다. 삼문전이란 판 위에서 정말 신명나게 놀아버린 작가가 최돈상인 것 같다. 고 하였다. 이후로도 동국서화학회나, 서법요청전, 세계서예비엔날레 등을 통해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한편으로 동우가 예술대학을 수료하고 40대 곧 2000년쯤에서부터 시도하고 발표하기 시작한 작품의 부류가 한자,한글을 불문하고 한 글자를 반복한다든가 아니면 겹쳐서 나열하여 완성한 작품들과 작품이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는 혼돈(混沌)의 장법(章法)을 구사한 작품들이다. 나는 굳이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의 구분을 위해 문자추상이나 현대서예니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다. 가독성(可讀性)이나 현대성(現代性)의 가부(可否)나 유무(有無)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고 발표하며 개성적인 서예세계를 펼쳐가는 것이다. 일종의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 작가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작품을 위해 상상의 블랙박스에 축적하는 것이다. 최근에 검정색을 길들인다는 것 설레는 일 아닌가? 라는 광고 문구를 들은 적이 있다. 작가는 자신의 상상을 길들여야 변화하는 것이다. 동우는 이러한 구상의 작품을 2008년 삼월 두 번째 삼우전(경인미술관)에 발표하였다. 소품(小品) 위주의 전시회였고, 비록 많은 작품은 아니었으나, 학정 선생은 작가는 상(常)과 무상(無常)의 조화를 늘 고민해야 한다. 동우는 기교(技巧)를 털고 무심(無心)의 경계에 가고픈 의도의 작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보인다. 고 평하고 풍격(風格)의 제고(提高)를 당부했다. 40대 후반기의 사색은 또 하나의 전환기로 나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 는 피카소의 말처럼, 전체적인 경향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본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을 쓴다는 방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필세(筆勢) 동우와 함께 서예전시장을 찾고, 고맙게도 부쳐준 도록들을 감상하노라면 늘 세(勢)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눈다. 나도 물론 그렇다. 세(勢)에 대한 직접적인 느낌과 인식을 창작과 감상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勢)는 발휘되어 작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구성인 장법(章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요, 곧 어떤 사물이 발전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추세인 세(勢)는 호탕(豪宕)함에 이르는 첫 째 관문이자 작가가 기본적인 서법 형식의 훈련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勢)는 일종의 심리적 의향(意向)으로 어떤 작품을 할 때 창작의 주도적인 동기가 있고, 어떤 정감(情感)과 기분이 있으면 모두 세(勢)의 힘을 빌려 전달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한 작품에서 아무리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자형(字形)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었다 할지라도 심리적 의향을 일으키는 작용을 소홀히 했다면 불규칙한 감각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세(勢)를 다하면 마음대로 써내려가도 다 옳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보통 필세(筆勢)로 대표해서 말하는 세(勢)가 포괄하는 내용은 곧 필세(筆勢), 형세(形勢), 정세(情勢)의 방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필세(筆勢)는 필수적인 기본 서법으로 골기(骨氣)와 형사(形似)가 모두 뜻에 근거하고 용필(用筆)에 귀결된다.는 것이요, 형세(形勢)는 점선의 장단대소(長短大小), 사정곡직(斜正曲直)과 소밀(疏密)등 배합의 대비(對比)를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작가가 이러한 몇몇 변화로 형성된 형상의 특점을 이용하면 자기의 형식풍격을 한걸음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분간포백(分間布白)의 균칭효과(均稱效果)와 대비효과(對比效果)에서 하나의 형세(形勢) 구성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따라 상응하는 형세를 표현하면 풍부한 장법(章法)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세(情勢)는 일종의 의상(意象)의 표현이다. 의상(意象)은 사람의 의식, 생각과 정감이 연상을 일으키는 것이니, 정세(情勢)는 주관적인 정취가 객관적인 조건의 유도 아래 발생하는 심리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른 상(象)은 다른 의(意)를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다른 세(勢)를 형성하여 나아가 각기 다른 풍모(風貌)를 형성한다. 때문에 장법(章法)을 구성하는 사유의 기초가 되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을 보이기도 한다. 내가 보는 동우는 객관적인 사물에 대해 대상을 깨닫고 정신을 통하는 것을 중히 여기고 철저하게 깨달음으로 얻은 의상(意象)을 어떤 작품에 응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창작활동에 형성되는 어떤 추세를 관통하게 하는 유형으로 보인다. 어떤 의상(意象)을 얻으려면 객관적인 생활에 대해 섬세하고 독보적인 체험적 관찰을 해야 하고, 자연의 관찰을 통해 무한히 상상하여 더욱 묘(妙)가 얻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끊임없기를 바란다. 카오스(chaos) 통일 신라 시대에, 의상(義湘,625~702)이 중국에서 화엄경을 연구하고 그 경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30구 210자의 게송(偈頌)으로 지은 시가 법성게(法性偈)인데, 그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하나에 모두 있고 많은 데 하나 있어( 一中一切多中一)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이니( 一卽一切多卽一) 한 티끌 작은 속에 세계를 머금었고( 一微塵中含十方) 낱낱의 티끌마다 세계가 다 들었네(一切塵中亦如是) 한없이 긴 시간이 한 생각 찰나이고( 無量遠劫卽一念)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한 겁이네( 一念卽是無量劫)』 또 『장자(莊子)』 내편(內篇)에 남해에 임금이 있어 그 이름을 숙(萬)이라고 하고 북해의 임금을 홀(忽)이라하고 중앙의 임금을 혼돈(渾沌)이라 하였다. 언젠가 숙과 홀이 혼돈을 찾아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숙과 홀은 혼돈에게서 받은 대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그 은혜를 갚고자 했다. 사람에게 이목구비 일곱 구멍이 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묘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 편히 숨 쉬고 잘 수 있는 코가 그것이다. 혼돈에게 홀로 이런 것이 없으니 우리가 힘을 합해 뚫어 줍시다. 두 임금이 힘을 합하여 혼돈에게 매일 한 구멍씩 구멍을 뚫어 갔다. 마지막 이레 되는 날에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이 완성되자 혼돈이 죽고 말았다. (南海之帝爲萬. 北海之帝爲忽. 中央之帝爲混沌. 萬與忽. 時相與遇於渾沌之地. 渾沌待之甚善. 萬與忽謀報渾沌之德. 曰. 人皆有七竅. 以視聽食息. 此獨無有. 嘗試之鑿. 日鑿一竅. 七日而渾沌死)는 구절이 있다. 모두 카오스 곧 혼돈(混沌)에 관해 말한 것이다.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는 천지창조 이전의 혼란스러움 또는 무질서란 뜻으로 쓰이며, 코스모스(Cosmos)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단계로 천지의 구별과 질서가 없는 엉망진창의 무질서한 상태와 암흑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락(奈落)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 내면에는 창조의 근원 이라는 심상(心象),인상(印象)이 내포되어 있다. 무심코 내뿜는 담배 연기도 카오스적 해석에서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무질서한 듯 보이나 일정한 법칙으로 해석할 수 있어 예술방면에 있어서 창작의 근원을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난해한 본성(本性)의 의식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현상적인 해석만 생각하더라도 전통서법에서 장법(章法)이나, 공간과 선의 경계에 대한 해석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도입된 장법은 격식의 속박을 완전히 벗어난다. 따라서 더욱 큰 융통성과 신축성을 갖추게 된다. 전통서법에서 옛사람들은 카오스에 대해서 심오한 깨달음을 형상으로 전이(轉移)를 시도한 것이 아니고, 대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형상의 경지를 탐색했다. 갑골(甲骨) 및 청동기 명문(銘文)은 장법포국(章法布局) 상에서 대소참치(大小參差), 소밀착종(疏密錯綜)이 마치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다. 전체가 서로 어울리고 서로 호응하여 전체가 한 글자가 되어 질박하고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다하는데, 모든 서체에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것이다. 카오스는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규칙 현상에 내재된 일정한 규칙이나 법칙을 해석하고 밝혀내 어느 정도 이론으로 체계를 세울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전통서법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의식의 세계에 관한 것으로 뇌가 기존의 관념을 제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후자는 물리학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동우는 이러한 카오스에 대한 것들을 동양의 우주사상인 무극(無極) 사상-우주의 가장 근원적이며 형체도 모양도 없는 본체에 접근하여 무형상성(無形象性)의 측면인 형체는 없으되 이치는 있다(無形而有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것은 노자나 장자에서 나와 음양(陰陽)과 허실(虛實)의 문제로 확산되는데, 이것을 서예 저변의 철학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서법에 도입하여 전통에서 발견하고 더불어 심연(深淵)의 카오스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가끔 발표하는 들쑥날쑥한 참치착락(參差錯落)의 장법을 구사한 작품과 전체가 뿌연 한 덩어리로 보이는 작품은 그러한 시도이다. 허(虛)와 실(實)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실제로 서법에서 응용하며 분석할 때 도입하는 허(虛)와 실(實)은 눈에 띄는 것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나의 부족한 안목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제대로 구사하는 서예가는 많지 않다. 그것은 기법으로만 이해하고 심미의식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예술철학으로 흡수하여 우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힘차고 굳센 운필(運筆)-실(實)한 필획(筆劃)에 도취(陶醉)되어 오직 무사가 칼을 휘둘러 목적 대상을 결단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데만 휘말려 자연스러운 가운데 나타나는 풍부한 자태(姿態)를 망각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조형(造形)이나 장법(章法)에 영향을 미쳐 예술작품의 효용에서 향기와 색깔을 전파하고 물들이는 것인 지는 두말할 것조차 없다. 다만 차를 달이듯 맛과 향기와 색깔을 우려내는 일은 충분한 수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는 하다. 서법에서 보통 무형(無形)의 사전(使轉), 가는 것, 부드러운 것, 경쾌한 것, 먹물이 적은 것, 힘을 적게 쓰는 것, 성긴 것 등은 모두 허(虛)적 방면에 속하고, 유형(有形)의 점획, 침착한 것, 굵은 것, 강한 것, 먹이 많은 것, 조밀한 것, 힘을 들이는 것 등은 모두 실(實)의 방면에 속한다. 허(虛)한 필획만을 구사하면 가볍고 미끄러지며, 실(實)한 필획만을 구사하면 글자의 형태가 둔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글씨의 묘(妙)는 허(虛)한 곳은 더욱 허(虛)하게 하고 실(實)한 곳은 더욱 실(實)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운(韻)이 동(動)하는 글씨를 쓰고자 한다면 정동(靜動)과 방원(方圓)도 함께 써야 하지만, 바로 허허실실(虛虛實實)을 소중하게 여겨 자유분방하고, 멈추고 바뀜과 느슨해지고 팽팽해지는 운필(運筆)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운필(運筆)과 글자의 결구(結構)와 더불어 더욱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은 장법(章法)과 그것을 통해 서예작품으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심미철학의 구현(具現)과 소통(疏通)이다. 살펴보건대, 동우는 허실(虛實)에 대한 일단의 사고를 노장사상(老莊思想)에서 흡수하여 구현하고자 한다. 물론 허실은 중국 고전미학의 중요한 법칙이며 고대예술의 상당한 미학특징을 개괄하고 있다. 많은 서화가들은 실(實)을 채우는 것이 허(虛)이고 모든 형태와 색을 유지하는 것은 도(道) 즉 무(無)라는 형태도 색도 없으나 실체라고 인식하는 노자사상을 물상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는 여백으로 끌어들여 유무상생(有無相生 유무는 서로 생겨난다), 허실상자(虛實相資 허실은 서로 의지한다)의 미학으로 작품에 관통시켰다. 철학적으로 갖는 유무(有無)의 이중적 구조를 떠나면 노자는 현상계에서 만물은 유무(有無)의 통일체, 곧 허실(虛實)의 통일체로 보고 있는데, 허(虛)는 반드시 실(實)에 의하여 존재하며, 실(實)도 반드시 허(虛)에 의하여 존재하므로, 허가 있고 실이 있도록 해서 통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노자는 천지의 공간은 온갖 바람을 다 만들어내는 풀무와 같다고 했다. 기(氣)가 충만한 허공의 존재를 인식하고, 만물이 유동하고 끝없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은 허공의 존재임을 설파하였는데, 이러한 허(虛)는 무(無)의 허(虛)에 합치한다. 「노자 11장」은 허(虛) 곧 빔의 효용에 관해 가장 근사하게 역설하였다.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집중된다. 그 바퀴통의 속이 비워 있음으로 수레의 쓰임이 있다. 진흙을 반죽하여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속에 빔이 있어 그릇으로 쓸 수가 있다.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는데 방이 비어 있음으로 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있는 것의 이로움은 없는 것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三十輻共一激 當其無 有車之用 旼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蓬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모든 물건의 효용은 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유(有)는 무(無)에 의해서 비로소 존립할 수 있다. 어떤 물건에 허(虛)가 없이 실(實)만 있고, 무(無)가 없이 유(有)만 있다면 그 물건은 작용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본질을 잃어버린다. 노자는 허실(虛實)이 서로 의지함을 말하여 얼른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에 현혹되고 얽매이는 것을 도외시(度外視)하고, 허(虛)의 존재와 도(道)의 생성을 말하여 빔의 쓰임으로 생기는 물건의 존재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로움을 위한 존재를 말한 것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보완되고 상호 발휘되는 것이다. 허(虛)곧 빔은 미완성의 공백과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서법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의미 있는 구상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작품을 보고 여백이라고 끼워 맞추는 어설픔은 의미 없는 공백의 잡음이다. 단순한 공백은 기(氣)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건대, 동우는 허실(虛實)에 관한 이러한 사상을 추구하며, 이러한 생각이 투영된 작품을 위해 반복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다. 가끔 과장되어 보이는 것은 강렬한 대비(對比)효과를 도입한 것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것은 예로부터 서사(書寫) 위주의 전통서법 작품에서는 매우 찾기 어렵고, 현대의 서예가들에게서 시도를 가끔 볼 수 있다. 서예작품에서는 문자라는 소재상의 형태가 자형(字形)의 법칙을 유지하면서 효용을 가지는 허(虛)의 존재를 생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심법(心法) 심화(心畵) 전통서법에서 서(書)를 정의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 대강을 훑어보면 이렇다. 서(書)는 마음 그림이다(書 心畵也-楊雄). 서(書)는 산(散)이다(書者 散也-蔡邕). 서(書)란 상(象)을 모방하는 것이다(書者 法象也-張懷瓘). 서(書)란 여(如)이고, 서(舒)이고, 저(著)이고, 기(記)이다(書者 如也 舒也 著也 記也-張懷瓘). 서법은 마음을 전함이다(書法乃傳心也-項穆). 서(書)는 마음이다(書者 心也-項穆).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書者 如也-劉熙載). 서법은 심법이다(書法卽心法也-祁經). 서(書)란 형학(形學)이다(盖書 形學也-康有爲). 여기서 장회관이 말한 법상(法象)도 물상(物象)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의상(意象)과 서정(抒情)의 과정을 말하고, 다음에 글씨의 실용성과 형상성을 아울렀으며, 강유위가 말한 형학(形學)은 세(勢)를 전제한 정의라 할 수 있으며, 각기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은 서(書)는 마음이요, 마음 작용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마음과 글씨의 관계는 인품(人品), 사상(思想), 성정(性情)에 연관한다. 일찍이 장자(莊子)는 인간의 본질을 덕(德), 성(性), 심(心)으로 파악했다. 인간의 주체로 본 것이다. 맹자(孟子)와 마찬가지로 성(性)을 심(心)에서 찾고 있는데, 마음을 좇아 무의식중에 예술정신으로 승화시켰으며 예술적 인생을 성취하게 되었으니, 심(心)이 바로 예술정신의 주체이다. 이는 장자정신의 핵심인 마음의 재계(齋戒)-심재(心齋)로 일관되게 이어지는데, 공자(孔子)와 안회(顔回)의 문답을 통해 밝히고 있다. 심재(心齋)에 대한 안회의 물음에 공자는 대답했다. 심재 곧 마음의 재계란 마음의 활동을 하나로 통일시켜 잡념을 떨쳐버리는 일이다. 지각에 의해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氣) 곧 우주적 직관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귀는 단지 감각적 판단을 맡을 뿐이고, 마음은 단지 지각의 주체에 지나지 않는다. 감각과 지각은 형상에 얽매어 활동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주적 직관인 기는 스스로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으므로 천변만화하는 일체의 사물들을 자유자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재의 진상(眞相)인 도(道)는 이 우주적 직관에 의해서 비로소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있게 된다. 심재란 이러한 우주적 직관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비워나가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지식이 있어서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말은 들었으나 지식 없이 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이같이 쉽다 어렵다 있다 없다 하는 상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저 텅 빈 것을 잘 보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안에 눈부신 햇살이 비쳐 저렇게 환히 밝지 않느냐? 행복과 같은 좋은 일도 이 호젓하고 텅 빈 곳(마음)에 모이는 것이다. 동우는 위에서 말한 전통서법의 정의와 장자 예술정신의 주체인 심(心)에 심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에 심(心)의 연작을 통해서 생각으로 각인하고, 인품과 사상과 성정 도야의 한 수단으로 화두를 삼으며,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실험하고, 서예작품으로 형상화시켜 예술가가 감상자와 더불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또한 인품에 대해 스스로에 다짐하는 외침이기도 하다. 그것은 빈 마음이요, 무심이다. 신선하고 활기가 있는 울림이 있게 하는 텅 빔이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나와 늘 함께 붙어 다니던 대학 시절에 감명 깊게 읽고 권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법정스님의 무소유(無所有)였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무소유의 진정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궁색하지 않고 홀가분한, 빈털터리가 아닌 채로 무위(無爲)에 접근하고자 하고, 비우는 마음을 처세(處世)의 다짐으로 삼으며, 그의 예술적 심화(心畵)를 그리고자 하며, 삶의 회포를 풀고자 하며, 그 자신과 같고자 하며,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마치 법정스님의 말처럼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내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오두막 편지에서.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홀로 사는 즐거움에서〉고 노력하며 기도한다. 마치며 예술은 우리의 영혼을 일상의 먼지로부터 씻어주고, 작품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 의해서만 살아있다고 한다. 이번에 동우가 보여주는 80여점의 작품은 소품에서부터 대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과 장법을 추구한 작품들이고, 2001년부터 발표하지 못했던 작품들을 볼 수 있으니, 40대까지 추구하고 공부해왔던 서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 50대의 필묵여정(筆墨旅程)을 위한 숙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도 보인다. 스승이신 학정선생님이 첫 번째 전시회에서 당부한 거속(去俗)과 공(工)으로 불공(不工)을 구하라 함은 관상자(觀賞者)들의 눈에 그대로 비쳐지리라 생각하며, 하나하나 작품에 대한 감상평은 안목을 갖춘 작가들의 한 마디에 맡기려 한다. 또한 우리의 안주거리로 남겨두면서... 우리는 흔히 예술가의 부단한 노력이나 작품의 새로운 시도에서 예술성이나 시대성을 찾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 순수, 일탈, 고뇌, 열정, 정수 등의 표현을 통해 포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열정을 불태우고 순수하며 실험적이라는 것과 작품가치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술가로서의 자질과 작품가치의 척도를 혼동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술품의 진정한 가치는 작품이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나의 벗 동우는 이것을 잊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과 함께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영혼의 숨결이 작품에서 항상 느껴지기를 바란다.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 있지 않을 때도 머나먼 길이지만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까지... 취향도 많이 다르고 부족한 벗이 천학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수선한 글을 적었으니, 널리 이해바라며, 이번 전시회가 심기일전(心機一轉)의 한 획이며, 동우다우며, 한국적인 서예의 전개를 확립하는 계기이기를 기대하노라니, 침굉선사(枕肱禪師)의 읊조림이 심신을 흔든다. 『내 가슴속에 한 구절을(也吾胸中有一句) 그대를 위해 읊노라니 몹시 어렵구나(爲君題詠最難形) 나의 벗이 만약 무슨 말이냐 묻는다면(吾師若問甚陵語) 바람이 풍경을 흔든다고 말하리라(向道風搖殿角鈴)』 2009년 10월 4일 이팝나무 가지 끝에 가을이 앉은 낙연재(樂煙齋)에서 이 선 경 |
|
| 동우 최돈상의 작품세계 | |
서예는 문자를 표현 대상으로 하여 작가의 심상(心象)을 표현하는 선(線)의 예술입니다. 최돈상 작가는 한지 위에 문자를 예술의 영역에서 선으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또한 서예의 본질에 접근하여 문자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의 선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을 이룹니다. 최돈상 작가는 서예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화와 현대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할 때 평범하게 문자를 나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대적인 감각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대비를 준 작품이 <訥言敏行(눌언민행)>입니다. 작품 <行道(행도)>는 “해석하면 도를 행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도”는 자연의 순리를 말합니다. “행”자는 초서이고 “도”자는 행서로 표현하였습니다. 상당히 큰 공간이지만 공간을 최대한 단순화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예의 선은 가늘어도 공간을 지배할 수 있고 잘못 쓰면 굵어도 공간에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의 선은 공간에 비해서 그리 굵은 선은 아니지만 충분히 공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의 각도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통일성 있게 하면서 오로지 선질(線質)로써 승부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예에서는 매끈한 선보다는 배가 물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 가는듯한 그런 까실까실한 선을 최고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 선은 오래 묵은 고목나무에서도 찾을 수 있고 우뚝 솟은 태고의 주상절리(柱狀節理)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은 올바른 법(法)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수련을 거쳐야만 나올 수 있음을 작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서 마음 심(心)자를 반복 나열해서 태고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심상화한 작품인 <태고의 숨결을 찾아서>와 <心(심)>은 의도성 보다는 즉흥성에 기인한 작품들로서 현대적인 감각을 띤 수작입니다. 작품 <琵琶行(비파행)>은 중국 당대(唐代)시인이자 정치가인 백거이(白居易)의 시 비파행을 말합니다. 비파 타는 여인의 인생역정과 한(恨)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붉은색 화선지에 검은 먹으로 표현하여 특유의 강렬함을 주는 작품입니다. 작품 왼편에는 비파 타는 여인의 이미지를 그려 넣었습니다. 오른편에는 수백자의 원문과 해석문을 곁들였으며, 작품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화면 구성의 조화로움에 쪽에 비중을 둔 작품입니다. 서예 작품은 서예의 선만 정확히 안다면 이 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세밀함보다는 투박한 몇 개의 선으로도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데, 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붓의 리듬과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며 그것은 바로 이미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파 타는 손과 비파 줄, 비파 타는 여인의 휘날리는 긴 머리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또 다른 작품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시를 서예로 표현한 작품 <이육사 시 청포도>입니다. 청포도의 시에서 한 구를 오른편에 고체(古體)로 크게 쓰고 왼편에는 시 전문을 서간체로 자유롭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큰 글자와 작은 글자의 대소 대비를 이용한 작품입니다. 고체는 정음(正音)체 혹은 판본체로 부르기도 하는데 딱딱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글자 같지만 작가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서체입니다. 또한 몇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작가마다 다양한 색깔과 변화를 낼 수 있는 서체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반면 궁체는 일정한 틀에 갇혀져 있기에 더 이상의 변화는 찾기 어려운 반면 서간체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서체이기도 합니다. |
|
ARTIST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