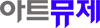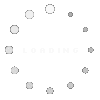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2018-01-09 | 작가노트-도취 |
도취 ........ 몹시 아파 몸져누운 날에야 어머니는 꿀물을 타다 주셨다. 그리고는 그 거친 손으로 배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그때서야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어머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늘 외로웠고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웠지만 그것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삶이 고단하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가 늘 측은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웠다. 어린 나는 그 외로움을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달래곤 했다. 이름 모를 한 마리 새와 나비, 언덕위의 할미꽃, 우물가의 물앵두 나무 그리고 강아지와 마당 앞의 살구나무...... 그래서일까? 나는 ‘여인’에 집착한다. 나의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은 우수에 젖은 듯한 눈매와 표정을 하고 있다. 다소곳한 여인의 자태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친구가 되어주었던 작은 동물들과 꽃, 나무 이런 것들을 그려 넣어 그때 교감했던 그 느낌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자연에 도취되어 있던 어릴적 작은 아이는 아직도 내 안에 살고 있다. 때로는 사랑에 도취되게 하고 때로는 슬픔에 도취되게 하고 또 때로는 추억을 그리워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열정의 에너지가 되어준다. 2013년 여름에 김단 |
|
| 2018-01-09 | 작가노트-슬픔은 상처와 절망을 통해서 온다 |
슬픔은 상처와 절망을 통해서 온다. 상처에는 외상에서부터 이별, 상실, 오해 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절망은 욕망의 좌절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얻고자하는 욕망은 너무나 다양하여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크게는 애정, 명예, 물질, 권력의 욕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느끼는 슬픔의 강도는 반드시 상처와 절망의 크기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이 느끼는 개인의 수용적 태도, 삶의 자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어떤 사람은 더 미려하게 상처를 느끼듯 슬픔의 크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슬픔이란 감정이 없었다면 인간은 정말 불행할 것이다. 슬픔이란 감정은 우리를 행복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혀와도 같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와도 같다. 인간은 슬픔을 통해 소중한 것들을 더 잘 인식한다. 슬픔을 통해 겸손해지고 반성하고 새로워진다. 슬픔을 통해 꿈을 꾸기 시작하고 긍정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2011년 여름에 김 단 |
|
| 2018-01-09 | 작가노트-내재적 감정의 표출 |
내재적 감정의 표출 재작년 신종플루가 걸렸던 일주일은 내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약기운으로 버티면서 온갖 상념에 빠지기도하고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기도 하면서 기억이 끝나는 곳까지 거슬러 올라갔을때 내 감정은 아련한 슬픔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때 고통도 아닌 아픔도 아닌 외롭고 쓸쓸한 그래서 더러는 슬픈 그런 감정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그것이 이 작품들의 출발점이다. 의식의 밑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오래된 좀 더 근원적인 내재적 슬픔들을 끄집어내고 싶었다. 나는 내 그림들에서 여인이라는 대상을 통해 감정을 이입하고 여인의 자세와 표정,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이라는 무채색을 이용하여 나의 감정을 극대화 시키고자 했다. '슬픔'이이라는 커다란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절제된 화면위에 되도록 화려한 색채들을 제거하였다. ‘먹’이라는 재료의 특성과 캔바스 천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색조의 조화를 통해 순간의 감정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배경을 거친 마띠에르로 표현하여 얇은 붓터치의 대상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하였다. 검정과 흰색은 우리 전통의 색상이기고 하고, 한의 정서와 연관되기도 한다. 나는 흰색과 검정색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상이 있다. 돌담에 둘러쌓인 디딜방앗간에서 흰 무명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고 방아를 찧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내가 아주 어릴때 보았던 풍경이다. 말없이 방아를 찧던 어머니의 모습은 그렇게 서글퍼 보일 수가 없었다. 일속에 지쳐 늙고 병들어 가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또 성장한 나에게도 커다란 슬픔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저런 직책을 이유로 아침이면 시내로 나가 저녁 늦게야 돌아오시는 날이 많았다. 엄격한 할아버지 깐깐하신 할머니 밑에서 시집살이가 고달팠던 어머니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삶이 버거워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듬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어머니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미안해했다.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는 나는 늘 가슴이 아팠고,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늘 외로웠고 쓸쓸했고 알수 없는 슬픔 같은 감정이 솟구쳐 오르곤 했다. 사람들은 행복, 기쁨,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좋아한다. 나도 그렇다. 그렇지만 나는 인간이 가지는 감정의 하나인 슬픔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확대해보고 싶었다.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감정에 몰입하고 하나되고 해체되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고,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진해지듯 인생도 그러할 것이다. 슬픔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싶었다.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나는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여 있던 그 슬픔의 우물을 바닥까지 길어 올려보고 싶었다. 2011년 여름에 - 김 단 |
|
ARTIST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