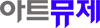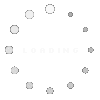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물’은 초월적 교감의 통로 | |
‘물’은 초월적 교감의 통로 ‘탁탁타다닥’ 불 꺼졌던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전기가 들어오는 그 순간 전구에 불이 밝혀진다. 환하게 불이 밝혀지는 그때야말로 전구가 제 존재 증명을 하는 순간이다. 인간인 우리도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과 같은 찰나가 있다. 내내 멍하니 꺼져 있다가 짜릿한 전기가 들어오면서 환한 불이 밝혀지는 순간이다. 지금 여기 살아 숨 쉬는 나와 현재를 인식하는 때가 바로 그렇다. 그러는 동시에 우리는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 순간의 죽음을 보게 된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매 순간순간이 날숨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사라진다. 지나가는 모든 순간은 작은 죽음들이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살다가는 우리는 그와 같은 ‘시간’일 따름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저서 《존재와 시간》을 통해 이와 같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의하고 있다. 배유미 작가의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도 유사하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시간성 속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가운데 존재한다고 말한다. 배유미 작가에게 그 관계성은 ‘물’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처럼 시공간에서 동떨어진 존재들(고흐, 클림트, 모네, 마크 로스코, 쿠바)을 만난다. 한낱 순간이라는 상태를 살았던 존재들의 정서적 교감과 교류가 이 ‘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그 통로가 ‘물’인 것일까? 작가는 어린 시절 창밖에 맺힌 물방울을 통해 비친 세상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꿈같은 평화로운 세상이 담겨 있었다. 물빛은 그녀가 원하고 꿈꾸던 곳을 어디든 데려다줄 수 있는 ‘타임머신’ 같다고 느꼈다. 그처럼 물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투명하게 비춘다. 인류 역사에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던 이 물에 대한 상징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물이 가진 의미의 바다는 그야말로 풍요롭게 차서 넘쳐흐른다. 비가 흩뿌리고 난 후 뿌연 먼지와 불순물을 걷어낸 세상은 그 얼마나 선명하며 맑고 쾌청한가. 물방울은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내비친다. ‘물’은 또 인간의 감성을 예민하게 만든다. 예민하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주변의 존재를 더욱 또렷이 인식한다는 것이다. 선명하고 맑은 색채, 풀어 흐트러진 형상들이 자유롭고 솔직 담백하게 드러난다. 작가는 화폭 속에 일상적인 풍광과 사물들을 담아내지만, 가식이나 자신을 얇게 포장하고 있던 표피를 벗어내고 제 안에 고스란히 투과한 시간의 흐름을 정직하게 담고 있는 것을 그린다. 오래된 자동차나 정취를 그대로 담아내는 옛 도시의 풍광 같은 것들이다. 그녀에게 예술은 시공간을 초월한 초감각적 교류이며, 이런 교류가 작가에게 행복감을 준다. 그처럼 예술가의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하얗고 깨끗한 화폭 위에 있다. 행복이 고통이나 불안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평정심과 정신적 충일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던 니체의 말이 떠오른다. 아트스토리 –김민희- |
|
ARTIST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