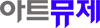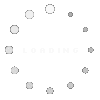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추억에서 길어 올린 작품세계-문영대 | |
추억에서 길어 올린 작품세계 최병창의 최근작은 지난날과 비교 했을 때 두 가지 점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하나는 소나무와 매화나무가 주요 소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소나무, 특히 적송(赤松)이 유독 눈에 띈다. 두 번째는 색상이 과감해진 반면 화면은 보다 소박해지고 단순해졌다는 점이다.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라는 이 말에 그가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저의 작품 근간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인 경북 기계면 내단리에는 달 밝은 밤이면 야산 바위에서 흰 소복차림의 여인네들이 기도를 올리곤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숨죽이며 여인네가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떡과 과일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들과 달리 촛불이나 부적 등에 신기해했고, 그 여인네는 ‘무엇을 빌었을까’에 궁금증을 자아내며 그런 의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소나무의 그림자가 왜 그리도 길던지, 또 대나무 잎은 약한 바람에도 어찌나 사각 거리는 소리가 컸던지... 우리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리고 마을 어귀에 서있던 장승과 솟대가 그때는 어찌나 높고 커보였던지요...” 그의 작품의 원천은 그가 털어놓은 말처럼 어렸을 때 몰래 훔쳐본 민간신앙의 기억과 추억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 일관되게 어린 시절의 기억과 추억에서 온축된 소재들, 즉 소나무, 장승, 솟대, 부적, 달, 산, 문풍지, 기와, 꽃담 등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그림의 표현 형식과 방법에서 조금씩 변화를 가했을 뿐 작품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러면 그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잠시 지난날의 작품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최병창의 20대는 화가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각종 공모전에 출품,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경남미술대전 연 4회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 연 3회 입선, 그밖에 프랑스 르 싸롱전, 목우회, 신라미술대전 등에서도 특·입선을 했다. 그 당시 그는 <인간+자연>이라는 그림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 <인간+자연> 시리즈는 바위 위에 놓인 정한수, 북어, 새끼줄, 부적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들이다. 그가 언급한 바대로 어린 시절의 체험과 기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로서의 탄탄한 기초와 기반을 닦은 시기가 지나자 서서히 그의 화폭에도 변모가 띄기 시작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안동문화방송 미술담당자로 입사한 후 몇 년이 지났을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다소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이 이때부터 화면에 채워졌던 것이다. 낮과 밤이 공존한다던지, 하늘에 난데없이 기와 문양을 그려 넣는다던지, 커다란 낮달과 투명한 달,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화면 구획, 또 화면의 겹침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추억이 오롯이 작품에 함축되도록 노력했다. 작품 표현 형식 변화 때문인지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는 명상적이면서 고요하게 바꿨다. 그런 한편, 한 화면에 서로 다른 시간대의 공존과 화면들의 겹침 등은 카메라의 오버랩기법과 유사한 점에서 어쩌면 그가 방송국에 근무한 경험이 그의 작품에 반영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퇴직한 후인 최근작에는 내단리의 추억과 안동의 정취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듯하다. 소나무와 매화나무가 화면의 주요 테마로 등장하고 있는 점에서 그리고 보다 과감한 색상 사용과 화면이 단순 소박해진 점에서 그렇다. 하긴 사반세기를 안동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그곳이 그에겐 고향이나 진배없기도 하다. 게다가 안동에 살기로 작정하고 변두리에 장만한 집에 소나무와 매화나무를 손수 심은 것도 이 때문이리라. 따라서 그의 화폭에서 두 고향 정취가 혼합되어 묻어난다고 해도 크게 잘못 본 것은 아닐성 싶다. 물론 그가 고개를 앞뒤로 끄덕일지 좌우로 흔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의 작품은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인지 밤이나 빛이 스러져가는 어슴푸레한 시간대를 묘사한 작품이 유독 많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서 시(詩)와도 같은 고요하면서도 때로는 위엄이 서려있는 경우도 가끔 맞닥뜨리게 된다. 사실 어슴푸레한 시간대를 그리기란, 서서히 다가오는 자연의 적막을 전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소나무는 어떤가. 소나무는 막상 작품으로 그리려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너무 세밀하게 그리면 품위가 떨어지고 또 적당히 그리게 되면 기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소나무 그림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의 최근작에는 유독 소나무가 많다. 화면에서 소나무들은 장중한 힘으로, 또는 자연의 영원성에 대한 관념으로 가득 차있는 듯하다. 강인해 보이는 소나무는 자연의 힘과 굳건함의 화신(化身)인 양 화면 공간 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화면 원경에는 산의 형상이 펼쳐져있고, 그 너머에는 달이 떠있다. 산 아래에는 서낭당 또는 강이 흐르고 있고, 또 어떤 그림 근경에는 길이 시작되도록 해놓은 것도 있다. 길은 이리저리 구부러지면서 그림 깊숙이 사라져 간다.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왠지 사람들의 존재가 느껴진다. 또 간결하고 시원한 색조의 연잎과 활짝 핀 하얀 연꽃들은 물과 나무와 어우러져 묘한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최근작에서 볼 때 최병창은 품격 있는 적송(赤松)과 매화 등을 통해, 화면의 소박과 단순성 등을 통해 새로운 길 찾기를 시도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즉 현실적 소재를 취하면서 그 소재의 본질에 더욱 접근하려는 태도, 이것이 최근 그가 작업하는 본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 그의 작품은 단순하고 평온한 명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듯하다. 그의 다음 작품이 벌써 궁금해지고 기다려지는 것도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문영대(미술평론가) |
|
ARTIST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