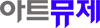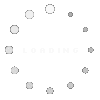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2021-02-09 | 염원에 대한 사유미학 |
염원에 대한 사유미학 崔 炳 昌 展 작업일지 1 캔버스는 정을 나누고 가까이 하였던 관계의 줄이 날실이 되어 현재의 형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돌고 돌아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줄은 얽히고 설킨 매듭이 되어 세월에 단단히 묶여져 버렸음을 깨닫게 한다. 벌써 삼십년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그 바다는 다시 못 올 그리움처럼 나무도 되고 물도 되고 바람도 별도 되었다. 긴 시간 그리움을 파종하여 그 바다로 향하는 아픈 자국이 캔버스에 채워졌다. 작업일지 2 낮과 밤이 공존하고 어둠과 밝음이 교차되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낮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이야기들을 화면의 겹침을 통해 표현하였다. 과거의 기억과 추억을 오로지 화폭에 담고 싶어 실존하지 않는 초현실적 화면 위에 그 동안의 표현 방식과 방법을 탈피하여 표현하였다. 소박하고 단순하며 고요하나, 장중한 힘을 전달하고자 주제로써 적송을 선택하였으며 그것은 긴 시간의 흐름과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뿌리내리길 소망하는 주문 같은 염원인 것이다. 침묵처럼 자리한 산과 각각 저마다 외롭게 떠 있는 섬들은 두고 온 그리움의 원천이자 세상에 얹혀살지만 하나의 존재로 제 몫을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절실함인 것이다. 최병창은 1959년 경북 기계에서 태어나 경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980년부터 마산을 기반으로 작가의 청년기를 다지며 부산, 경남, 대한민국미술대전, 목우회등 각 공모전과 여러 그룹전을 통하여 대외적 창작활동과 1986년 경상남도 미술대전 추천작가로 시작하여 현재 경상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경상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이며, 2014년 경상북도 예술상을 수상하였다. 개인전 7회, 한국회화 4인 초대(뉴욕), 부산미술 재조명전(부산시립미술관 개관 기념), KCAF초대, 2010 FINE ART ASIA(홍콩), 한국현대미술 100인초대(경주세계문화엑스포), 포항국제아트페스티벌, 이스탄불-경주 한국・터키 예술 합동교류전, 아시아탑호텔페어, 대구아트페어, 서울아트쇼2013, SOAF초대, BAMA2014초대, 대구호텔페어, WITH ARTFAIR 초대, 신풍미술관 초대기획전, 2015 Asia Contemporary Art Show (홍콩), 아트경주2015 초대, 2016년KIAF초대 등을 가졌으며, 경상남도 미술대전을 비롯한 여러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
|
| 2018-01-17 | 최병창-하루를 열면서 |
하루를 열면서... 최 병 창 오늘 하루, 눈을 뜨면 또 다른 세상을 볼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은 그 속도에 두려움을 느낀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욕심과 도전은 또 다른 삶을 강요하며 위협을 가한다. 적당히 타협 할 수도 없고 순응치도 못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고 혼돈의 사고는 오늘도 붓을 들게 한다. 스치고 지나온 수 많은 시간 속에서도 가슴속 한 구석에 깊이 자리 잡은 모습. 그것은 들락날락 거리는 마음속 생각에서 원초적인 생명성을 마주하고 싶은 맑고 간결한 소망인 것이다. 모든 것이 떠나고, 흩어져 변하여도 고향같은 짙은 에머랄드그린의 그리움이다. 긴 시간의 흐름과 풍파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뿌리 내리는 소나무, 달 밝은 밤 바람에 흩날리는 꽃눈과 향기, 흙탕물 속에서도 결코 허용치 않는 순백의 연꽃, 자연은 그렇게 깨달음의 주체이자 삶의 감지자이다. 산마루에 땅거미 길게 질때까지 첨벙거리던 냇물, 끝을 알 수 없는 그 길은 어찌나 멀기만 보였던지... 내가 걸어 올 길이였고, 이제 다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란 걸 어렴풋이 알 것도 같다. 언제나 그랬듯이 습관처럼 하늘을 쳐다본다. 영글지 않은 채 일찍이도 떠오른 낮달은 아련한 기억 속에 머물게 한다. 인간의 욕망아래 모든 것이 변하고,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파괴되며 죽어가는 이 자연을 다시 품을 수 있을까? 어린 날 기억들을 그리움으로 노래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어쩌면 그래서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향을 묘사하며 마음을 채우고 , 치유하고자 하는 것일게다. 내 어린 날 그리움으로 물들은 자연으로 회귀함이 지나친 욕심일까? 오늘도 빈 캔퍼스에 그 마음 채워본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소리 없이 걸으며... |
|
ARTIST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