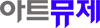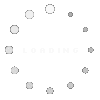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도시, 그 일상적 분주함으로의 복귀-윤진섭 | |
도시, 그 일상적 분주함으로의 복귀 윤진섭(미술평론가/호남대 교수) 조근호는 대상에 대한 탐구를 지칠 줄 모르고 수행하는 작가다. 대상과 그것의 표현이라는, 실로 고통스러운 심연에 갇혀 지낸다. 회화는 그것이 내적 고백의 형태를 띠는 추상이 아닌 한, 외부의 대상과 나누는 대화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언술 행위에 따르는 것이 바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란 결국 표현이기 때문이다. 조근호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양한 표현술을 지닌 작가다. 개인전을 열 때마다 매번 다른 표현술을 선보인다. 작업실에 갇혀 캔버스와 씨름을 하면서 자신이 대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고심한다. 그 결과가 전시장에서 보는 작품들인데 그것은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는 최근 나와의 대화에서 작품을 발표하기가 겁이 난다고 지나치듯이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 말의 행간에서 대상과 나눈 대화를 옮기는 작가의 심적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 조근호에게 있어서 대상은 자연이요, 도시다. 그는 이 둘 사이를 진자처럼 왕복하면서 그 본질을 파헤치려고 노력한다. 그는 스스로 자기 세계를 1. 추상실험, 2. 심상적 풍경, 3. 인간과 자연, 4. 일상 속 풍경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9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추상실험’의 시기를 제외하면, 현재에 이르는 그의 전 제작 시기가 자연과 도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자연과 도시를 다룸에 있어서 조근호의 화풍은 구체적인 묘사에서 점차 단순한 표현술로 이행해 왔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은 가령 내가 그의 개인전 서문을 썼던 2000년 무렵만 해도 구체적인 대상의 형태를 갖췄던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그의 화풍의 변화는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개인전 이후에 조근호는 점차 대상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이 단순화되면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은 색의 단순화다. 이른바 대상의 단순화와 단색조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화면은 점차 관조적이 돼 갔다. 그 극단은 <밤>(162x97cm, 캔버스에 유채, 2003) 연작이다. 어둠이 산을 삼켜 점차 검은 색을 띠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이 연작에는 검은 색의 미묘한 톤이 화면 위에 부드럽게 나타나 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둠이 단지 검은 색만은 아니다. 마치 여명처럼 산등성이 언저리에는 짙은 회색으로 칠한 톤의 변화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 무렵의 그림들은 색상에 변화를 주면서 단색조로 처리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는 이들에 대해 “우리 마음을 고요함 속 안식의 시간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조와 안식이야말로 조근호 작품의 특징이다. 그는 자연에 대한 깊은 사색과 오랜 모색의 시기를 거쳐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다. 대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사상(捨象)하는 가운데 그것이 핵심에 도달한 것이다. 그것은 언젠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되풀이될지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가 대상에 대해 기울인 인식은 일련의 과정, 즉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두고 ‘작가적 의식을 지닌 작가’라고 부르고 싶다. 다시 말해서 탐구하는 작가, 자기 인식에 투철한 작가, 그리하여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작가라는 의미에서다. 카메라의 초점을 흐려 찍는 사진기법을 연상시키는 그의 작품들은 형태의 단순화와 색채의 단순화를 동시에 추구한 결과다. 대략 2003년의 개인전을 전후하여 시도된 이 화풍은 그 이후에 제작된 작품들의 가장 큰 특징을 이룬다. 그것은 마치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녹색 단색조의 <도시의 밤> 연작을 비롯하여 <들> 연작, 바다와 호수, 강, 섬 등을 그린 2006년 무렵의 작품들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이 연작을 보면서 단순하게 표현한 풍경화가 색의 절제가 주는 밋밋함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같은 그림을 보면서 이년 전에 봤던 감흥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특히 수평구도로 그린 호수의 경치는 담담해서 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난다. 조근호의 근작은 초점거리를 벗어난 피사체처럼 흐릿한 모습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도시와 자연의 일상적 모습을 표현한 근작들 역시 구작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화려한 색채다. 캔버스에 유성물감을 듬뿍 묻힌 붓을 비벼서 미묘한 톤을 내는 특유의 기법을 바탕으로 그 위에 다양한 크기의 점을 그려 넣고 있다. 근작들은 구작이 지닌 관조적 느낌에 비해 훨씬 활기에 차보이며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 일련의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근작에 나타난 점은 호수나 강의 풍경을 그린 그림에서 불빛을 점으로 표현한 것의 연장이다. 그것이 확장돼 일련의 점묘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비록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생략이 돼 있지만, 아파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이 작게 표현돼 있다. 근작은 구작이 정관적임에 비해 활기에 차 있고, 분주하게 오가는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집이나 빌딩에 켜 있는 불빛들이 화려하게 캔버스를 수놓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조근호의 그림이 다시 색을 찾아 나선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자연에서 도시, 그 분주한 일상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변화의 시작, 이번 개인전은 그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다는 의미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
|
ARTIST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