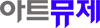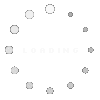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2018-01-16 | 작가노트-꿈을 꾼다 |
꿈을 꾼다. 길을 해 매다 낯선 곳에서 잠을 깬다. 그곳은 어디인가? 그곳에서 나는 누구일까? 시원한 바람과 코끝을 자극하는 그 자연의 냄새 애절하게 그곳이 그리워 질 때쯤 기억을 더듬어 조용히 붓을 든다. 그리고 명상에 잠긴다. - 2011년 5월 어느날 |
|
| 2018-01-16 | 허필석-바다로 가는 길 |
허 필 석의 작가노트 바다로 가는 길... 나는 어릴 적 깊은 산골 작은 마을에서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다. 앞뒤로 큰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기에 항상 ‘저 산 너머엔 뭐가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유독 떠나지 않는 그것은 저 너머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실로 바다를 보지 못한 나로서는 산 너머의 세계를 그저 상상만 해 볼 수밖에 없었다. 유년시절의 신기루와 같았던 것이다. 어느 날 높기만 하던 그 산을 드디어 가 본 것이다. 정상에서 내려 본 반대편은 똑같은 산들이 중첩이 되어 있을 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아주 평범한 모습일 뿐이었다. 훗날 그 지역은 바다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 산에 오른 내 행동이 무척이나 후회스러웠다. 그냥 그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오래 간직할 걸 하는 아쉬움만 남았던 것이다. 분명 있어야할 바다는 없고 끝없는 산봉우리들만 내 눈앞에서 겹쳐 보일 뿐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우리네 일상과도 같은 것이다. 끝없이 반복되는 현대인의 삶은 꿈이라는 이상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다. 수도 없는 실재풍경들을 그려 왔다. 앞으로도 그릴 것이다. 풍경은 내안의 휴식과 같고,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희망인 셈이다. 그 풍경이 실재에서 잠깐 벗어나 이제는 내 자신의 구도로 그려 나간다. 마음의 길이고 풍광인 것이다. 길은 굽이굽이 끝없이 연결되어지고 산과 들은 저 너머로 끝없이 중첩되어 진다. 그리하여 어릴 적 소년의 꿈은 하나씩 끄집어내어져 그 길에서 걸어가고 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길을 그려내고 싶은 게다. 그리하여 그 작은 희망과 꿈을 그리는 것이다.그리고 바다를 그려낸다. 아주 간결하게... 열 번의 개인전을 통해 보여 진 내 작업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생각으로 일관되어 진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인물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풍경화 또 다시 여섯, 일곱, 여덟 번째는 인물화를 거쳐 아홉, 열 번째는 풍경화로 진행되고 있다. 마치 반복되는 일상과 같이 똑같은 사이클이 되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언제까지 반복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인간 표현에 지칠 때쯤이면, 어김없이 풍경의 매력에 빠져 들고 그 속에서 또 다시 사람의 모습을 찾게 되고, 다시 자연으로 반복되어 진다. 해서 지금도 작업실엔 꽤 많은 인물과 자연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과거엔 자료(사진) 없이는 작업을 하지 못했다. 어떤 대상을 표현하기엔 참고할만한 그럴듯한 사진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언제 부턴가 사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단순히 나의 표현력을 믿었던 건 아닐 것이다. 늘 내 머릿속엔 어린 시절 실루엣처럼 아련하게 남아있는 상상속의 풍경에 집착되었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내 모든 자료를 무의미 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젠 형태와 색깔 모든 게 정해져 버린 사진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 지금 나에겐 풍경화의 표현 욕구는 겉으로 보이는 자연의 탐닉에서 내안에 감춰진 자연의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작가는 ‘손’의 표현기술력에 의존하고, 어떤 작가는 예리한 ‘눈’을 통해 세상을 관찰하고 또 어떤 작가는 ‘머리’를 통해서 대상을 해석 하려 한다. 하지만, 나는 손과 눈과 머리 보다는 내 감성을 애절하게 표현하는 ‘가슴’으로 그리는 작가이고 싶다.” 난 흔히들 말하는 구상작가다. 붓으로 물감을 풀어서 캔버스에 나의 구상능력을 살려 맛깔나게 그려가려고 노력하는 구상작가 말이다. 하지만 나의 작업은 정통적인 재료를 쓰지만 작업과정에선 정해진 순서는 없다. 흔히 우리가 배워왔고 알고 있는 방식을 취하진 않는다. 어떤 대상과 구도를 미리 정해놓지도 않는다. 흰 캔버스에 임의로 정한 부분부터 내가 쓰고 싶은 색으로 붓 끝에 힘을 실어 표현하고 그 다음에 대한 계산도 하지 않는다. 그저 표현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따라 갈 뿐이다. 그 붓질에서 나타난 형상과 색은 때론 바다가 되고 하늘이 되고 산이 되고 나무가 된다. 내 그림을 편하게 봐주길 바란다. 지금 내 보이는 그림은 미술사적 대안이나 거대담론을 가진 작업은 아니다. 그저 유년시절 그토록 갈망했었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신기루를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 신기루는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꿈속에서 가끔씩 마주하게 되지만, 어김없이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첩첩산중이다. 오늘도 붓을 부여잡고 저산 너머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그리고 있다. 산을 그리고 있다.나를 그리고 있다. 2008.5 허 필 석 |
|
ARTIST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