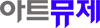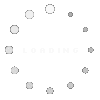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태영호 작가 작품세계_ 자연의 혼돈을 정렬시켜준 것일 뿐 | |
자연의 혼돈을 정렬시켜준 것일 뿐 자연은 신비롭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형형색색의 자연이 빚어낸 신비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색과 재료들로 섞이고 응축되었다 퍼지며 자기들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든다. 마치 허름한 창고 옆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부식된 오래된 페인트 통처럼 말이다. 알면 알수록 바라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자연의 신비는 인위적이지 않은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인간을 한순간에 매료시킨다. 아름다움을 찾아 이러 저리 돌아다니던 태영호 작가의 눈에 들어온 것 또한 자연스러움이 빚어낸 신비 그 자체였다. 내면의 형태를 찾아 나서다 독특한 추상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태영호 작가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10년 전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작가는 자신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마음의 눈을 따라가던 중 어느 나지막한 산의 한 창고에 시선이 멈췄다.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당시를 이렇게 묘사했다. “비바람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부식되고 있는 형형색색의 그 페인통의 옆면은 아름다웠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추상적 아름다움(이었다)….” 작가는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색을 칠하기보다는 뿌리는 작업을 주로 하고, 여러 색들과 재료들이 섞여 만들어내는 미지의 형태와 미지의 색을 화폭에 담고자 했다. 의도되지 않은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아름다움 또한 작가가 지향하는 바다. “저와 캔버스가 마주 섰을 때 진실로 자연스럽고 싶었어요. 캔버스를 바닥에 깔고 왁스, 젯소, 물품, 아크릴 물감, 톱밥 등 모든 재료들과 색을 자유롭게 섞어서 뿌렸죠.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더군요….” 작가는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 나름대로의 패턴과 조화로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뿌리기를 한 후 혼돈의 색채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개입을 하게 됐다고 한다. 적당한 개입만이 친근한 하모니를 이룬다 그러고 보니 작가의 그림에는 유사한 패턴의 모양들이 자주 등장한다. 자연과는 좀 반대돼 보이기도 하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다. 이들 패턴은 현재 자신의 마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작가는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모양과 가장 비슷한 형태로 그림의 요소들을 묶어줌으로써 무의식적인 자유로움 안에서의 무질서를 정렬시켜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된다. 작가는 “자유롭게 뿌린 색의 조화에 혹여 자신의 개입이 지나쳐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침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부조화의 오염’이 되고 만다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꼈어요.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무분별한 개발로 돌아오는 것은 환경파괴와 지구수명의 단축뿐이라고 생각해요.” 틀을 깨고 싶다 작가에게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물었더니, “틀을 깨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아트페어에 참가해보니 한마디로 그냥 시장이더군요. 자신의 작품에 가격을 매기고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작품 속에서 고민해야 하는 시스템을 유도합니다. 다른 작가들과의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작가는 이러한 느낌을 설치 작업으로 표현했다.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욕심을 쓰레기통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쓰레기통에 욕심종이와 버리고 싶은 것을 버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관객들이 직접 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의 탈피적 쾌감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작가는 일주일의 전시기간 동안 “어른들은 잘 버리지 못하고 아이들은 잘 버리더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작가는 사회에서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의 도구가 꼭 캔버스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최근엔 가끔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촬영을 하곤 하는데, 다큐멘터리가 꾸밈없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작가는 “모든 작품들이 작가의 손을 떠나면 관객들이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작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 보는 분들의 자유로운 감상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작품은 설명문이 아닙니다. 작가의 손을 떠나 새롭게 해석되는 작품의 느낌 또한 아름답습니다.” |
|
ARTIST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