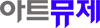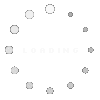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Choo Kyung-The Lost Flame, Regained_로버트 C. 모건(2022, 06 뉴욕 Kateoh Gallery 평문) | |
Choo Kyung-The Lost Flame, Regained
로버트 C. 모건(2022, 06 뉴욕 Kateoh Gallery 평문)
추경의 회화가 기반하고 있는 사유는 자연을 통한 통합(unity)인 듯 보인다. 그녀의 관점은 명확하다. 이는 추경의 추상이 갖는 물질성(physicality)이 사실적인 감성의 맥락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반드시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추경은 자신의 회화에서 동아시아의 회화가 필수적인 구성요소라 여겨온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리로부터 자신을 임의적으로 소거했다. 이는 나아가 불필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제거한다. 오히려 그녀는 자연이 자신을 인도하는 자연과의 일체감(a sense of unity)에 집중한다. 그녀는 이 점에 기반해 현재 생활하고 작업하며, 열정을 불태운다. 추경은 또한 이에 기반해 비존재의 존재로의 전환을 포착하는 언어적 간극을 발견한다. 아울러 이에 기반해 그녀의 열정은 공간과 시간을 정의한다. (중략) 예술가의 기억은 융(Carl Jung)의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ness) 개념과 가까운 무언가를 형성하는데, 이는 에너지(기)를 자신들의 이력(biography)이나 자신들이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차례로 한 예술가로부터 다른 예술가에게 전달한다. 추경은 “불과 불꽃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체의 숨결과 영혼의 형상화”에 대해 말한다. 추경 회화의 핵심은 불꽃(flame)으로, 이는 내면에 내재한 우주의 신비를 모색하는 예술가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녀를 치유하는 것(prescription)은 한지로 이는 그녀를 시공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감정은 신비로움이다. 신비로움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원천이다.”
☆ 로버트 C. 모건 박사는 미술작가,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 및 시인이다. 그는 로체스터 공과대학 미술사 명예교수이며 잘츠부르크 유럽과학예술 아카데미(European Academy of Sciences and Art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전세계 여러 국가의 현대미술과 예술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수 백 편의 논문과 평론을 발표했으며 이는 20여 언어로 번역되었다.
|
|
| 에킨 에르칸 (철학자, 미술비평가)_2022, 06 뉴욕 Kateoh Gallery 평문 | |
에킨 에르칸 (철학자, 미술비평가) 2022, 06 뉴욕 Kateoh Gallery 평문
한국의 미술작가 추경은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찬사를 아끼지 않은 소위 “매체특정성”(medium specificity)에 기반해 그림을 그린다. 매체특정성이란 “한 매체의 본질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모든 것과 일치하는 “각 예술의 특이하며 적합한 능력범위”를 말한다. 그린버그가 극찬했던 액션 페인팅 화가들(특히 탁월한 화가로 물감을 흩뿌리는 방식으로 작업한 잭슨 폴록)처럼 추경 역시 붓작업과 물감을 흩뿌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동작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예술적 행위를 정적인 모방, 그림문자, 혹은 구상적 사실주의에 머물게 하는 대신 추경은 앞서 언급한 모더니즘의 수호자들처럼 움직임(movement)을 포착하기 위한 추상작업에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예술적 행위를 그녀의 추상표현주의자 동료들로부터 구분해 주는 것은 실험적인 방법의 이용이다. 그녀는 토치를 이용해 화염으로 가려진 바위산을 연상시키는 잿빛이나 짙은 회색의 표면을 창조하며 이미지에 사실성을 부여한다.
추경 작업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정신은 캔버스를 다루는 방식이나 이력을 통해 강조된다. 추경은 서울에서 가까운 산에서 설미재 미술관과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과 물질성은 그녀 작업의 기반이다. 케이트 오의 전시는 추경의 전제 작품이 보여주는 광범위한 범주에 대해 말한다. 이 범주란 비자연주의적 이해의 범주로부터 추상표현주의적 경향을 정화하는 영역까지, 우리로 하여금 과정 기반의 시각(a process-based view)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중략) <불꽃-자연을 아우르며> No.2212-1에서 태운 캔버스 위의 칠흑같이 어두운 검정색의 기다란 띠 모양의 이미지는 밝은 포도주빛 한지 바탕을 가로질러 기록된다. <삶의 불꽃으로> No.1908-14에서 이 과정은 역전되는데 검은색의 띠 모양은 크림 같은 하얀색으로 여백은 선홍색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로 하여금 묘사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이용한 도구에 까지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도구는 물론 자연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결코 자연과 구분되지 않는 인공물이다. 이는 과정에 근거한 관점으로부터 부과된 것이다. 그러므로 추경의 작업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과정에 근거한 관점에 관한 사유를 촉구하는 “중심적인 작업”으로 여겨진다. 예들 들어 토치를 이용하는 기술을 자연을 “넘어서거나”(beyond) 혹은 어떤 의미에서 “비자연적”(not natural)이라 여기는 지배적이며 보편적인 관점은 나름 타당성이 있다. 결국 횃불은 숲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우리는 자연에 의해 수량화할 수 없는 것으로 회화를 격하할지 모른다. |
|
| 추경의 ‘자연회화(natural painting)’ _이아영 큐레이터 | |
추경의 ‘자연회화(natural painting)’ - 이아영 큐레이터
한국과 글로벌 추상 미술사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여성 미술가, 추경의 ‘자연회화(natural painting)’ 추경은 부산에서 아방가르드의 기치를 올리며, 실험적 미술을 표방한 미술동인 '혁(爀)'(1963년 결성)의 멤버로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1970년대 그는 청년 작가들의 전위적 흐름에 동참하여, 개념적인 추상미술 작업을 선보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 도불하여 1991년 귀국하였는데, 파리 유학 시절부터 시작된 현상과 관념의 “두 개의 대립적 세계를 하나의 직관적 이미지로 표상하려는 노력”은 추경 작업의 중심이 되어왔다. 귀국 후, 추상표현주의적 회화를 선보이며 국내 활동을 본격화하던 그는 1998년 경기 가평에 터를 잡으면서 자연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자연의 본성을 품은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흙과 물, 불과 바람으로 인해 대자연이 이루어지고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사유를 기반으로 세상을 이루는 본질인 지(地), 수(水), 화(火), 풍(風)에 기원을 둔, ‘자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유한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추경의 작업은 회화 매체의 문제와 이에 대한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현대미술의 제 문제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더니스트 회화의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2000년대 추경의 회화는 회화의 기본적 매체인 물감, 붓과 캔버스의 본성을 작업 과정에서 활용하여 그 본성 자체가 자연의 본질적 의미와 결합된 회화를 선보였다. 회화의 본질과 원리에 천착한다는 의미에서 모더니즘적이면서도 소재로서의 자연과 회화적 원리를 실현하는 과정이 긴밀하게 일체를 이룬 회화였다. 그리고 이는 온전한 추상이기보다는 가평에서 작가가 마주한 실재 자연을 담은 것이자 자연에 대한 작가의 관념이나 인상의 기록이기도 했다. <바람꽃(Wind Flower)> 연작부터는 순간적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매체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심화하여, 물감과 도구 사용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즉, 콤프레셔에 연결된 피스를 붓 대신 사용하여, 이를 통해 분사되는 압축공기로 캔버스에 얹진 물감을 흐트러트려 우연적 효과로 꽃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2010년대에는 이 작업 방식을 발전시켜 ‘바람’ 시리즈의 대표작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피스를 통해 분사되는 ‘바람’이 캔버스에 얹어진 물감을 흐트러트리는 순간적 프로세스에 의해 스스로 작품이 탄생되도록 한 이 연작들은 한 겨울에도 생명이 바람에 의해 전달되고, 잉태되고 있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얻게 된 ‘바람’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바람’에 의해 물감이 기화되거나 유동한 자취로 이루어지는 그의 ‘바람’ 연작들은 자연의 법칙과 우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 방법론 자체가 자연처럼 스스로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그림에 대한 갈망으로서 “자연에 대한 회화적 오마주”였다. 자연과 우연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비구상적 표현을 하지만, 화면에서 나뭇가지, 나뭇잎, 꽃잎의 형체들이 보여 지는 것은, 작가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자연의 형상이 직관적인 그의 작업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불’을 주제로 한 작업은 추경의 이전 회화들의 방법론 – 작가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관여보다는 자연의 법칙과 우연성,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그림 – 을 더욱 심화한 작업의 결과다. 추경은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미술사와 글로벌 미술사의 문제의식과 닿아 있으면서, 늘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이룩하였다. 한국 추상미술에서 자연에 대한 사유는 한국 현대미술이 글로벌 미술사에서 독자성을 획득하는 데 있어 주요한 근간이 되어왔다. 이는 모더니스트 회화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면서도,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한 한국 추상의 특성과도 닿아 있다. 그러나 추경의 추상은 관념적이거나, 자신의 수양의 결과물로서 제시하는 단색조의 화면이 아니라 자연을 몸으로 체득하고,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연성의 방법론을 스스로 획득하여 얻어낸, 남성중심의 추상미술계에서 간과되어 온 하나의 성취이다.
|
|
ARTIST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