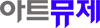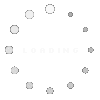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생동(生動)의 미학, - 강태웅 화론(畫論) -_이재걸 ∣ 미술평론가 | |
생동(生動)의 미학 - 강태웅 화론(畫論) -
이 재 걸 ∣ 미술평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서로 간섭하며, 모든 것은 생명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여든다.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모여듦’이라는 절실한 움직임일 것이다.” (강태웅, 작가 노트, 2022)
점진(漸進)과 선명(鮮明) 30년도 훌쩍 뛰어넘는 화업(畫業) 내내 작가 강태웅은 생명을 가까이에서, 더욱 가까이에서 관찰해 왔다. 한국과 미국, 대학과 작업실을 오가며 그가 그리고자 한 것은 기계적 산출이나 수학적 재할(裁割)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진정한 느낌이었다. 다채로운 생명 현상과 이로부터 생성되는 고도의 존재론적 사유는 오래전부터 작가에게 경탄과 반성(反省)의 대상이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회화는 고유의 스타일 안에서도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선(線)들은 소년의 숫기 없는 몸짓처럼 참신하기 그지없으며, 색(色)들은 천연(天然)의 살아있는 권능과 관능을 동시에 발산한다. 점과 선의 유기적 조합이 만들어 낸 ‘점진(漸進)과 선명(鮮明)’의 집합체로서, 강태웅의 그림은 자연의 오롯하고 맑은 정신성을 껴안는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눈에 우리는 화면에서 생성을 위한 균열, 차이를 위한 탈주, 그리고 그것들의 끝없는 지속을 발견한다. 작품은 자연의 원초적인 감각이 넘쳐흐르는 곳이며,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이 하나의 감각으로 융화되는 곳이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가 말하는 ‘차이와 생성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이 세계는 예견할 수 없는 확률로 존재하는 카오스(Chaos)로서, 일종의 ‘질서 이전의 무질서’이며, ‘고정될 수 없는 흐름’이다. 운동하고 전진하는 형상이 사라짐의 흔적을 동반하고, 이미지가 행위를, 입자가 파동을 동반하는 강태웅의 회화 스타일은 바로 이러한 세계관에서 비롯됐으리라. 그렇게 그려지고, 덧대지고, 긁히고, 눌리고, 흩뿌려지는 그의 작품은 ‘외관의 몰락’을 통해 세계의 내적 감각에 다가간다.
생명의 광휘(光輝) 작가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자연의 영원한 움직임을 향한다. 그는 생명의 리듬적 연속에 주목하면서 ‘고정된 생명성’이라는 환영(illusion)을 지울 수 있었다. 그의 ‘생명 표현’은 얼핏 해체적 충동이나 분열적 현기증으로 보일 법도 한데, 작품 앞에서 혼란을 느끼는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것이 탄생과 성장의 아름다운 진동(振動)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의 원초적 심상(心象) 안에서 형식과 개념을 구분 짓는 인공적 경계들은 무의미 해진지 오래다. 정신과 행위의 반복이 쌓아 올린 요철(凹凸)의 여백 위로 등장하는 기운생동(氣韻生動)과 ‘사물의 느낌’에 대한 깊고 얕음을 표현하는 전통적 필법(筆法)은 그의 회화가 형식적으로는 서양화이면서 한국화의 기품도 소중한 유산처럼 보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디 그뿐인가. 그의 그림은 이미지이면서 멜로디이고, 부분이자 전체이고, 오래된 기억인 동시에 지금의 찰나이기도 하다. 작가는 구분과 배척이 만든 ‘죽어 있는 형식’을 거부하고,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의 ‘관계 맺기’라는 ‘살아 있는 형식’을 섬길 뿐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가의 고된 노동 속에서 이성의 이분법과 문명의 이기(利己)는 절대 찾아볼 수 없다.
화가 강태웅이 무심한 듯, 신들린 듯 그려 낸 형상들은 멈추지 않고 끝없이 균열하며 생성한다. 사면팔방(四面八方)으로 퍼지는 이 생명의 진동들은 마침내 생명의 광휘(光輝)로 모여든다. 무언가 명료해지고 기분 좋은 느낌이다. 소멸이 탄생의 긍정으로 나아가고, 어둠이 밝음의 계몽으로 생기를 얻는 이 멋진 경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
|
| 그림이 된 생동(生動), Style is on ‘Movement’_안현정(미술평론가, 예술철학박사) | |
강태웅 작가평론 그림이 된 생동(生動), Style is on ‘Movement’
안현정(미술평론가, 예술철학박사)
집적(集積), 움직임, 변화, 흔적, 형식에 대한 도전, 그리고 자연으로의 회귀… 이 언어들의 끝에서 강태웅 작가의 시간들(The acts of the artist)이 하나의 양식(Style)이 되어 말을 걸어온다. 작품과 만나는 시간, 시작되는 듯 끝나는 색의 드로잉들은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이 되어 우리 주변을 에워싼다. 추상적인 색면 사이로 낯설게 등장하는 실루엣들은 어딘지 익숙하지만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 보는 이들은 ‘생동의 흔적들’을 단초삼아 스토리를 만들어보거나,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을 끄집어내어 자신의 경험과 연관된 ‘생각-상상의 선’을 창출한다. 작가는 이렇듯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을 추상 이면에 배치시킴으로써, 우리들을 응시와 놀이의 경험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순수의 원형(原形)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작가의 바람에 근거한 것이다.
원형의 색, 무위(無爲)를 담은 작업들 최근 작업은 정지와 움직임에 대한 고민들을 담았다. 감춰두고 다시 써서 올리는 작업들 속에서 색은 선택이 아니라 작가의 시간 그 자체를 표상한다. 자연에서 오는 색들, 가능하면 인위적인 색을 좇기보다 순수미학을 띤 원색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색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자 극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이에 대해 “어두운 색감으로부터의 탈피, 이는 초기 구상작업 당시 가졌던 사회비판적 작업에 대한 반발이자 색에 대한 일종의 콤플렉스”라고 정의한다. 만들어낸 색은 복잡다단한 우리사회의 욕망 덩어리와 닮았기 때문이다. 모더니스트 화가들이 추상을 선택한 이유가 전쟁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근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이라면, 강태웅 작가에게 추상은 어깨를 짓누르는 과거시대에 대한 반성이자 자유를 향한 예술가의 내적 고백인 셈이다.
행위와 이미지 사이의 간극, Process Abstraction 작가는 이젤에 캔버스를 올리고 그림을 그리는 대신, 캔버스 천을 바닥에 깔고 자신의 행위를 쌓아올리거나 테이핑의 요철(凹凸)을 자유자재로 구현함으로써 리드미컬한 ‘Movement’를 생성시킨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인공적인 구성, 문학적인 수식들이 배제된 화면 속에서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인 작업행위들은 비로소 자취를 드러낸다. 신체적 행위의 반복은 일종의 수행과정과도 닮았다. 상하좌우가 역전되거나 쌍을 이루는 작업들은 위계적인 논리를 철저하게 배재시킨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창작과정들은 작업실에서 이루어지는 창작자만의 축제이다. 다층 구조의 화면들은 내연과 외연, 음과 양, 허(虛)와 실(實)의 조화를 이야기한다. 작가는 스스로 그러했던 원래 그대로의 원형[自然]으로부터 인간성 회복을 위한 ‘긍정의 메타포-치유’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Movement> 연작들을 들여다보자. 바탕 혹은 주제가 된 양가적 색선(色線)들은 다양한 색들을 배경 삼거나, 채색된 선들을 형상으로 삼아 ‘객체와 주체’의 통일성을 보여준다. 무극(無極)과 태극(太極), 차고 어우러지고 비워냄이 한 화면 안에서 역동하는 모습들, 이렇듯 색채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동양사상의 핵심인 ‘중용(中庸; 치우치지 않음)’의 가치와도 맥을 같이 한다.
삶이 녹아든 작업, Meta Translation 작가는 추상에 도달하는 30여년의 세월에 대해 “천재적 직관보다는 노력·열정·고민 등 인생의 궤적(The Fever of Life)을 화폭에 옮긴 시간들이었다.”고 말한다. 남들이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작업들조차 형식·내용 모두에 있어 정체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사회비판적 현실을 전제한 80년대 도입기와 구상과 추상사이를 오가던 90년대 전환기를 거쳐, 작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른바 형상으로부터 탈피(Meta Translation), 이는 작가의 추상이 형식주의 미학을 가로지른 ‘개념 추상(Conceptual Abstraction)’의 계보를 만들어 왔음을 보여준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Context)은 예외 없이 모두 작품(Text)에 반영되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사회로부터의 의무, 뱉기보단 담아두어야 했던 위치 등, 작품의 충만함은 이러한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작업은 지난 세월과의 싸움이었고, 무아지경 속에서 자신을 내던진 시간이었다. 자유분방함에서 오는 중도(中道)의 깨달음 속에서 작업은 자연스럽게 추상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 미국 유학시절 이후, ‘순환-Circulation’ 시리즈와 ‘생동-Movement’ 시리즈가 “자연을 통한 인간성 회복 : 작업을 통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되었다. 가난하고 후덥지근한 펜실베니아의 민낯은 가면을 쓴 한국의 삶과 완전히 달랐다. 작가는 뉴저지의 세라믹 스튜디오에서 배운 도자, 스님에게 배운 안진경체의 서예를 작품에 혼합하는 등, 기존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식실험을 시도하였다. 당시 작업들은 신안 앞바다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노스텔지어를 연상시킨다. 삶의 본거지가 뒤바뀐 이질적 삶이었음에도, 여러 형태의 패널을 조합하거나 인쇄물 꼴라지 위에 동양적 기호(한지 및 선염기법 등)들을 덧입혀 현실의 이중적 궤적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다소 늦은 30대 후반, 새로운 자신을 찾아 떠난 유학길에서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무게를 떨쳐내고 진정한 자유와 만난 것이다.
자연으로의 회귀, 중도(中道)의 미학 미술은 미학적이어야 한다. 정치성과 사회성으로부터 벗어나 울림을 주어야 하며, 고통·아픔·상실에서 벗어나 치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쌍을 이루는 작업, One Square Foot(미국에서의 가장 흔한 단위)의 활용. 작은 조각들을 모아 덩어리를 이루는 작업 방식들은 ‘전체가 개별의 합’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미학을 담은 것이다. 모아서 합치고 이동하기 쉬운 방식은 내용을 배제한 순수형식의 추구와 맞닿아 있다. 이민자여야 했고 항시 이동해야 했던 다면화된 정체성을 ‘중층구조’에 반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질적인 문화와의 만남은 어두운 사회현실을 반영한 초기구상 작업을 ‘원형(原型)-원색(原色)-순수미학’의 추상으로 변형시켰다. 보이는 것에 대한 이해는 불가시적인 것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깨달음의 반영인 것이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음과 양, 내연과 외연, 형식과 내용, 동양과 서양 등. 이 상반된 가치들은 다름이 아닌 부분이 모인 하나로서의 전체를 보여준다. 프랭크 스텔라의 작업방식을 떠오르게 하는 작가의 미학은 ‘억압된 것으로부터의 해방=중도’를 법으로 삼은 ‘미완의 프로젝트’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
|
ARTIST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