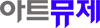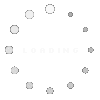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서양화가 문춘길의 행만리로(行萬里路)_김하린(시인,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 |
서양화가 문춘길의 행만리로(行萬里路) - 김하린(시인,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주로 남도서양화단의 전통적인 기법으로 고향인 남도의 풍광을 화폭에 옮기던 서양화가 문춘길의 작업에 변모를 가져온 것은 지난 1995년 첫 개인전을 가진 뒤, 10년 후인 2005년으로 추정된다. 그 때부터 문춘길의 화면에는 소나무가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며 작업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작가의 이전의 작업이 서양의 인상주의 기법을 남도의 자연에 투영한 오지호, 조규일, 최성훈 등 남도 서양화단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던 경향과 동일한 맥을 같이 했다면, 이 시기부터 문춘길은 그 맥을 이으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기 시작한다. 한 때 비구상이나 추상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나(그러나 본격적으로 작업에 옮기지는 않았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현대적인 방법이 아닌 과거로의 회귀였다. 그는 겸재 정선 등 조선 시대 화가들에게서는 물론 명,청 등 중국의 전통적인 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나무를 주요 모티프로 삼은 것은 물론 동양의 기법인 수지법(樹枝法: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줄기, 가지, 잎 등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서양화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수지법과 같은 기법보다는 기운생동과 같은 전통의 정신세계였다. 서양화가 최성훈이 그의 그림을 두고 ‘서양의 방법론으로 해석한 동양적 사유의 세계’라고 평한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라고 본다. 최성훈이 문춘길의 작품에서 동양의 기법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서양의 방법론’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도 기법보다는 정신세계에서 드러나는 그의 작품의 특징을 보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문춘길의 작품세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기존의 남도서양화단과 서양의 인상주의 화풍의 큰 흐름이 자연을 묘사하는 ‘미메시스(재현, 再現)’가 주를 이루었다면 문춘길의 작품세계에서는 ‘정신’이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잘 알려진 사실처럼 서양미술사에서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가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예술론을 내놓으며 자연의 재현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내용의 표현을 주장한 것을 현대미술인 추상운동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론이다. 다시 말해 자연의 외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를 그리려 하는 것이 현대미술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사실은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이끌었던 미국의 미술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가 모더니즘운동을 추상운동으로 한정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정신=추상, 즉 정신적인 것의 표현을 추상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린버그는 자신의 모더니즘 회화이론의 핵심인, 조각이나 다른 매체와 구별되는 평면성을 잭슨 폴록과 같은 추상표현주의 화가의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구상 작가인 마네의 그림에서도 발견했고,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차별화되는 모더니티의 선구로 마네를 지목한 바 있다. 이러한 그린버그의 이론을 곧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문춘길의 새로운 작업은 구상이라는 점에서 얼핏 다른 남도서양화단 작가들의 작품과 쉽게 구분되지 않지만 재현에서 정신으로의 변화라는 점에서 크게 차별화된다. 다시 말해 기존 작가들의 작품이 자연을 묘사하고 해석하는 자연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면 문춘길의 작품은 칸딘스키적인 정신주의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정년을 앞둔 문춘길은 평생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도 휴일이 없을 정도로 근무 외 시간과 방학 기간의 거의 모든 시간을 그림에 쏟았다. 이런 그가 유일하게 심취했던 것은 심리학이나 뇌 과학 같은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분야였다. 처음에는 교직과 관련된 심리상담을 위한 연구의 시작이었지만 나중에는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깊이로 나아갔다. 이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그의 미학적인 관심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그가 동양미학이 추구한 정신적인 세계에 심취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 그림과 문자가 탄생한 이후 생성된 미학 영역에서는 형태와 정신에 관한 형신(形神) 관념이 주된 명제로 등장했다. 이로부터 파생된, 형태를 그리는데 주안점을 두는 형사(形似)와 정신을 중시하는 신사(神似)에 대한 논의는 동진(東晉)의 저명한 화가이자 화론가였던 고개지(顧愷之)가 그림에 정신을 옮긴다는 ‘전신(傳神)’이라는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형신에 관한 논의에 방점을 찍었고, 이러한 그의 견해가 후대의 화론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언하자면 고개지의 전신은 묘사 대상이 지닌 정신적 요소를 작품에 집약시켜 감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문춘길의 방법론적인 선택인 정신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동양회화에서 이 정신의 본체로 가장 중시한 것은 사혁(謝赫)이 고화품록(古畵品錄)에서 제시한 육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중심적인 개념인 기운생동(氣韻生動)이다. 중국 명나라 말기 문인이자 화가, 서예가인 동기창(董其昌)은 이 기운을 배울 수 없으며 나면서 저절로 아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하늘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배워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독만권서 행만리로(讀萬卷書 行萬里路)’.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의 길을 걸으면” 잡스러운 것이 씻기고 자연이 마음속에 생겨 산수의 경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현대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하이데거는 예술가의 작품이나 시인의 시는 예술가나 시인의 머리나 손에서 창작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철학조차도 자신이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엇’이 자신으로 하여금 쓰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동기창이 말한 ‘하늘이 부여하는 기운’과도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기창은 하이데거와 달리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를 걷으라(讀萬卷書 行萬里路)는 친절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진경산수의 세계를 개척한 겸재 정선을 위시하여 전국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는 일이 조선 사대부들 사이에서 큰 유행처럼 번졌다. 김삿갓처럼 순례하듯 평생 동안 산수를 누빈 이도 허다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와 산천을 찾아 길을 떠난 문춘길의 행보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문춘길도 소나무와 그 소나무에 얽힌 역사적, 인문학적 흔적을 찾아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누비며 지난 2015년 ‘전남의 명송(名松)-100경(景)’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그 기록과 그림을 담은 화집을 발간했다. 이 작업을 통해 그는 전라남도 보호수로 지정된 소나무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답사하는 한편 각종 문헌을 통해 그 소나무와 관련된 인문학적, 정신사적 연구를 병행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의 동양인들이 소나무라는 하나의 자연물에 대해 인간과 관련하여 그 조형적 아름다움이나 상징성을 인문학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들었던 것을 주목하고, 소나무에서 풍겨 나오는 지조와 절개, 은은한 기품과 당당함에서 오는 감정을 인간에 빗대어 시와 회화에서 표현했던 전신(傳神)의 정신사적 측면을 연구하며 자신의 작품에 반영했다. 문춘길은 특히 조선 진경산수의 거장 겸재 정선의 한국적 실경 표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겸재의 인왕제색도등에 표현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적인 소나무들의 특성을 집중 탐구했다. 예를 들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나무에 비유해서 그린 겸재의 <사직 노송도>에 나타나는 오랜 연륜과 역경을 이겨낸 특이한 소나무의 모습을 실감 있게 표현한 작품의 구성과 표현기법에 나타나는 형사(形似)적 특성과 정신을 옮기는 ‘전신(傳神)’의 사례를 자신의 작품에 적용시킨 것이다.
지난 2015년의 전시가 전남 일대의 소나무가 대상이었다면 이번에 열리는 <한국의 명송과 아름다운 산하>전에서 출품한 작품들은 작가가 그 범위를 넓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의 산하를 누비며 소나무를 탐구한 작품이다.
이번 전시회 출품한 경북 예천의 <금당실 송림>도 그러한 작품 중의 하나다. 수십 점에 달하는 이번 출품작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금당실 송림>을 중심으로 문춘길의 작품세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작품의 도상을 살피면 화면 가득 수십 그루의 소나무 들이 무리지어 하늘을 가리고 있고, 화면 좌우로 두어 채의 집들이 자리하고 있다.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좌측의 소나무는 마치 허리를 구부린 듯한 인체의 형상을 띠며, 중앙의 소나무들의 도상은 한 사람은 서있고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교차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도상으로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소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형상을 이룬다. 화면 좌우에 있는 두어 채의 집들도 이러한 연상들을 보조하며 암시해 주고 있다. 소나무 기둥의 중간과 상단부의 표피에 나타나는 황금색은 인간을 연상시키는 작용을 배가하는 한편, 부귀하고 풍족한 유토피아적 세계를 암시하고 있다.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면 우선 이곳 경북 예천 금당실이 정감록에서 전쟁이나 질병, 천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이상향인 십승지(十勝地)중 한곳으로 기록되었다는 자료를 살펴야 한다. 또한 이 마을의 송림은 북서풍과 수해를 막기 위해 수백 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우여곡절로 훼손된 역사와 약 110여 년 전에 결성된 사산송계(四山松契)의 지속적인 관리로 수백그루의 소나무 숲이 고택이 즐비한 마을과 공존하는 마을 공동체 의식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문춘길은 답사를 통해 이러한 소나무와 관련된 역사를 살피는 한편, 금당실 송림에 깃든 ‘마을 공동체 정신’과 이상향을 추구하던 동양 사상을 소나무의 형상 속에 불어 넣고 있다. 형상에 정신을 불어 넣는 바로 이러한 작업에서 문춘길의 작품은 앞서 말한 바 있는 기존의 남도서양화단의 그것과 차별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문춘길의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이 소나무 숲은 단순한 소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류하고 교감하는 공동체적인 유토피아의 세계를 창조해내고 있다. |
|
ARTIST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