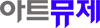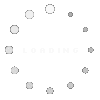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2018-01-17 | Korean | [홍성사 편집주간] ‘간직함’과 ‘나눔’의 항아리 |
‘간직함’과 ‘나눔’의 항아리 항아리에 대한 기억을 무엇보다 뚜렷이 떠올리게 하는 것은 장독대의 항아리와 김장철 김칫독이 아닐까 싶다. 바지런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길이 닿아 낮에는 햇살 가득 머금었던, 그 항아리의 뚜껑 덮이는 소리와 함께 하루해가 저물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소음과 침묵 속에서 된장과 간장이 익어갔다. 겨울을 앞두고 가득가득 담아 둔 배추와 무김치는 땅에 묻힌 가운데 깊고 곰삭은 맛을 더해갔다. 이제는 다 옛 이야기가 돼버린 일상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네 항아리는 이렇듯 소중한 것을 담고 있었다. 그것이 장과 김치여서만은 아니다. 지금보다 훨씬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을망정 함께 나눔의 살가운 정이 오롯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다.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지불한(혹은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아진 지 오래인 세상, 미래의 꿈나무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아니, 알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조광기의 이번 개인전은 바로 이 항아리들이 주된 모티브를 이룬다. 그의 작품을 눈여겨보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느낌이 들 것이다. 항아리가 꽉 들어찬 화면 구성도 그렇거니와, 색채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강렬한 톤을 이룬다. 그는 이 점에 대해 “잠시 봄옷으로 갈아입은 것”이라며 운을 뗐다. 지금까지의 작업을 사계절 가운데 겨울에 비유하자면, 이제부터 펼쳐질 세계는 봄이라는 것이다. 함축적이고 은유적으로 말한 ‘화폭의 봄’은 색감이 달라지는 것 이상의 변화를 예고한다. 땅을 더욱 깊이 갈고, 튼실한 알곡을 위해 필요한 이런저런 손이 많이 가는 일들에 골몰하다 보면 하루해가 더욱 짧게 느껴질 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항아리에는 산과 바위가 있고, 나무와 구름이 있고, 꽃과 사람이 있다. 추상화되고 개념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대상이 명확하게 담긴 것이다. 산란하는 빛과 어둠의 대비가 두드러진 화면에는 도시의 얼굴과 체취도 담았다. 항아리의 표면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담겨 있는’ 모습들은, 어쩌면 그려두기를 넘어서서 담아두고자 하는 작가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것일 수도 있다. 최근 한동안 그의 작품을 이루는 대상들을 받쳐주고 아우르던 모티브는 바위였다.(보는 이에 따라선 석축石築이라 할 수도 있겠다,) 영겁의 시간이 응축된 차가운 광물질의 바위 위에는 그가 무심히 그은 선과 담백한 색채로 형상화한 생명력이 넘쳐난다. 만발한 꽃과 노니는 새들이 있고, 뻐끔거리는 입으로 시어(詩語)를 내뱉는 듯한 물고기들이 있다. 자연과 하나가 된, 천상(天上)의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던, 원초적 인간의 모습에 가까운 형상일 것이다. 그의 바위에서는 상상의 동물도 비상(飛翔)에의 힘찬 염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듯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상생에 대한 염원은 <천부경(天符經)>을 돋을새김과 음각으로 각각 나타낸 한 자 한 자에 응결되어 있기도 하다. 그의 항아리는 바위(혹은 석축)의 연장선상에 있는, 새로운 모티브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화업(畵業)의 발자취, 곧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고 간직하기 위한 작업의 또 다른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서 우리네 음식 문화 속의 항아리를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어쩌면 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을 항아리의 이미지가 있다. 백자 항아리에서 느끼는, 장식과 기교를 배제한 단순한 형태와 소박한 맛이 그것이다. 누군가 ‘세상 모든 것을 보듬어 안은 어머니의 품’이라고도 했던가. 그런 편안함과 아우라가 깃든 이런 항아리는 실상 몹시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태어나는 것이다. ‘흙과 유약과 불의 예술’이라고도 하는 항아리를 빚는 작업은 고행의 길을 걷는 구도자의 길이 아니던가. 제대로 된 항아리를 만들려면 내면에 켜켜이 쌓여 있는 거짓과 탐욕부터 씻어내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제 조광기는 화폭에 항아리를 빚어낸다. 앞선 작품들처럼, 그의 항아리도 화폭을 넘어서 혼합재료를 통한 좀 더 역동적인 매체로 이어질 뜻을 비치기도 했다.(이번 전시에도 일부 소개된다.) 잊혀져가는 우리네 일상의 항아리에 담겼던 그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또 어쩌면 ‘세상 모든 것을 보듬어 안은’ 그 무심한 듯 넉넉한 항아리에 그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일상의 행복을, 소중한 추억들을, 아름다운 자연을, 좋은 인연의 자취들을 담아낼 것이다. 박희진(朴喜璡, 1931~) 시인은 <항아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중략) 네가 놓이는/ 자리는 아무데고 끝인 동시에/ 시작이 되는 너는 그런 하나의 중심이라/ 모든 것이 잠잠할 때에도/ 너는 끊임없이 숨 쉬며 있는// 오, 항아리/ 너 그지없이 둥근 것이여/ 소리 없는 가락의 응결이여/ 물 위에 뜬/ 연꽃보다도 가벼우면서 모든 바위보다/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는 것// 네 살결 밖을 감돌다 사라지는/ 세월은 한갓 보이지 않는 물무늬인가/ 항아리 만든 손은 티끌로 돌아가도/ 불멸의 윤곽을 지닌 너 항시 우러른/ 그 안은 아무도 헤아릴 길이 없다” 시구에서처럼 ‘끝인 동시에 시작이 되는 자리에 놓일’, ‘연꽃보다도 가벼우면서 모든 바위보다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는’ 그 항아리를 감돌다 사라지는 우리네 세월은 정말 한갓 보이지 않는 물무늬일 수도 있다. 항아리를 그려낸 작가의 손과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은 언젠가 모두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불멸의 윤곽 속의, 아무도 헤아릴 길 없다는 ‘그 안’을 우리는 조광기의 작품에서 함께 들여다보며 나누게 될 것이다. 항아리의 안팎을 이루는 그의 조형 요소들은 뚜렷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는 작품을 통해 애써 목청 높여 발언하려 하지 않는다. 보는 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모습도, ‘알아서 해석/이해하시오’ 하는 식의 오만함도 없다. 함께 느끼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 그래, 그것…’ 하고 스치듯 지나쳤다가 언젠가는 다시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게 하며 살포시 여운을 남기는, 이런 일상의—평범하기에 소중한 줄 모르거나 잊고 사는—편린에 깃든 본연의 가치를 그는 담담하게 그려내고자 한다. 우리의 ‘우리다움’을 끊임없이 되물으며 고뇌하는 그의 작업은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 (송승호/ (주)홍성사 편집주간) |
||
ARTIS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