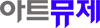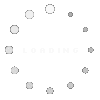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2019-04-01 | 작가노트_거울 앞에 선다. |
거울 앞에 선다. 어느새 30대(代) 후반이 되어있는 내 모습이 익숙하고 낯설다. 현실 안의 모순(矛盾) 속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며 찢겨져 오면서 가끔 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면 종종 빛바랜 일기장을 펼쳐든다. 지난날의 숱한 고민이 묻어 있는 낱말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금의 내가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는가.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을 새삼스레 의심한다. ( 출생,죽음,기쁨,슬픔,음악,사랑,만남,이별,젊음,늙음,여행,먹고 마시는 일, 수면 등등..........) 어쩌면 인생은 희극적인 시련의 반복이 아닌가 싶다. 다양하게 일그러진 ‘나와 내 주변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밝음과 어둠이 서로 섞여지는 어제와 오늘이 있고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나는 그 안에서 삶의 근거를 찾는다. 나에게 그림은 “친구”다.(인디언 말로 친구란 ‘내 슬픔을 짊어지고 가는 이’라는 뜻) 그 믿음의 출발이 때로는 자가 치유의 노력과 함께 나와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게 도와주며 그 안에서 나는 언제나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
|
| 2019-04-01 | 작가노트_탱화와의 만남 |
탱화와의 만남 1994년 겨울, ‘고려불화 특별전’ 탱화에 대한 나의 무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던 이 전시(展示)는 서양화(西洋畵)를 전공(專攻)한 나에게 특별한 것이었다. 그때 그 느낌의 전율(戰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치밀한 밑그림, 섬세한 선묘, 은근하게 우러나오는 색채의 미감(美感)등..... 그것은 완벽한 하나의 세계였다. 모든 것이 감탄 그 자체였고, 불교미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그림 앞에 엄숙해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떨리는 감동과 함께 답답한 화두만 안은 채 2년의 시간이 흘렀다. 1997년 광주시내에 있는 사찰 후불탱화를 맡게 된 선배의 도움으로 탱화작업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을 계기로 서양화에서 탱화로 내 작업을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감로(甘露)탱화 형식은 그동안 고민 해 오던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주었다. 인간의 ‘죽음’과 ‘구원’을 주제로 인간생활의 모든 애환(哀歡)이 대비를 이루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를 인식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나의 회화세계와 만났기 때문이다. 감로탱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죄업(罪業)은 우리들의 모든 현실행위를 반영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自畵像)’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 어리석고 외로운 영혼들을 붓끝으로나마 감싸 안고 싶은 것이다. 모든 예술은 인간을 위한 배려와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형식과 내용의 부진함이 많지만 전통을 잇는 작업과 형식실험이 가미된 일반회화로서 우리시대 감로탱화를 담아내려고 했다. 일상을 통한 삶의 일그러진 모습과 보편적 가치, 불운한 처지의 인간과 무참히 죽어버린 운명들과 소리 없는 절규(絶叫)들을 나는 그려내고 싶다. 연(蓮)꽃에 바쳐져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 *감로탱화(Buddhist Painting of Nectar Ritual) |
|
ARTIST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