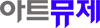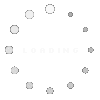박구환
나의 작업을 지켜본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숨 가쁜 속도주의와 파괴된 고향과 자연 그리고 기후 교란이 생명을 위협하는 오늘날 박구환의 작품을 만나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하이데거는 시인의 사명은 귀향이며, 시를 짓는다는 것은 최초의 귀향이라고 하였다. 고향이란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구환은 우리를 생명의 환희가 흐르는 고향으로 데려가는 시인이다”
언젠가부터 나의 작품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섬마을 풍경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생명의 결실을 의미하는 화려한 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은 나의 고향이 섬마을 아니면 바다가 가까운 곳이 아닐까..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시골에서 보낸 몇 년의 유년기를 제외하고는
인생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보냈다. 작품의 소재로 섬마을과 바다를 다루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
작가로서의 삶이 몹시도 힘들었던 시기, 도피처로 찾았던 곳에서 만난 ‘바다’는마주하고 서 있으면 알 수 없는 평온으로 다가왔고 결국 작품의 소재가 되어 삶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또 ‘만개한 나무’는 십여 년 전 작업공간을 도심에서 담양수북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그전까지 작품 속, 나무는 하나의 배경에 불과했었는데 어느덧 화면 속 주인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가끔 관람객이 작품을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지명을 말하며 그곳이 아니냐고 묻곤 한다. 그들이 기억하는 특정지역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그리운 곳으로의 여행을 다녀온 그들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정도 긍정도 아닌 대답을 할 때가 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들이 가고 싶은 그곳으로 이미 가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굳이 고백하자면 나의 작품 속 풍경은 누구나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고향도 아니다. 선명하지만 흐릿하고, 흐릿하지만 선명한 유년의 추억이다.
결국 나에게 고향이란,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풍경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본바탕의 감성이며 그곳의 향기, 색상과 형태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들리는 소음들까지 정겹게 느껴지는 곳이다. 그래서 나의 작품 속 고향이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익숙하고 정겨운 감각들을 되살려 내기를... 그렇게 담담하게 전해지는 삶의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작가 박구환은 1964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인성고(7회)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 순수미술과를 졸업했다.
1991년 도일(渡日)후 판화를 접하게 된 계기로 귀국하여 판화가로 전향하여 뉴욕,동경,후쿠오카,대만,카오슝,서울,부산,대전,전주,광주등지에서 34차례의 개인전 및 약500여 차례의 그룹전 및 초대전에 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광역시전, 무등미술대전, 도솔미술대전, 행주미술대전등에서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역임하였고 조선대학교, 목포대학교, 광주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 동아대학교 등에서 강사를 역임 하였다.
현재는 전업작가로 활동 중이며, 한국미협, 광주미협, 한국판화가협회, 광주판화가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주요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 광주시립미술관 / 남포미술관 / 아천미술관 / 성산아트홀 / 헌법재판소 / 광주광역시청 / 광주동구청 / 광주북구청 / 광주경찰청 / 광주교통방송국 / 문화관광부 / 광주전남21세기발전협의회 / 국립대만예술대학 / 국립대만사범대학 / 삼성의료원 / 조대병원 / 하나은행 / 롯데그룹 / 광주신세계백화점 / 대구지방법원 / 대한주택공사(칠곡) / 중화민국광주영사관 등
Contact Us: artmusee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