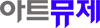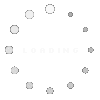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2018-01-15 | 작가노트-간절함에 바치는 ‘정안수' |
간절함에 바치는 ‘정안수’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망막 수술과 백내장 시술을 받으셨다. 한 달여가 지나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 뵜었는데 펑펑 우시는게 아닌가? 가끔씩 전화를 드렸을 때 눈이 자꾸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차차 좋아 지시리라 믿고 위안의 말씀만 드렸었는데... 단지 연세 탓만은 아닌 듯 싶다. 아들손자 커가는 모습을 못 보신다고 생각하니 더 목이 메이시는 듯 슬피 우시는 게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이루지 못 했다. 40여년 전 군인가족이었던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형, 누나와 함께 영산강 자락의 시골 외가에서 유아기를 지냈다. 우리 삼남매는 각종 가축들 괴롭히기?, 영산강에서 재첩잡기, 보에서 미역 감기 등을 하며 또래의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맘껏 뛰어놀다. 또 외할머니 몰래 광에서 곶감이며 홍시를 꺼내먹고 저녁이면 모깃불을 피워놓고 영산강에서 잡아온 제첩국을 배가 산이 되도록 푸짐하게 먹고 곧바로 떨어져 잠들곤 하였다. 겨울에는 외할아버지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팽이며 방패연,썰매 등으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곤 했다. 가끔 비오는 날이나 울적할 때는 대청마루나 사랑채에 앉아 엄마가 보고 싶다며 누나와 울곤 했던 날도 있었다. 놀다 지쳐 일찍 잠이 들어버린 나는 반드시 새벽녘에 일어나 소피를 보곤했다. 요강이 있는 마루로 나가 일을 보고 있노라면 넓고 푸른 하늘에서 무수히 떨어지는 별무리들을 접할 수 이었다.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하늘이었다. 그때 부엌의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좇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뚜막에서 열심히 중얼거리리시며 손을 비며 무언가를 빌고 계시는 외할머니를 자주 볼 수가 있었다.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쏟아지는 별빛을 뒤로 하고는 다시금 방으로 들어가 단잠을 이어 갔다. 몇 년 후 아버지는 군을 제대하시고 외국의 현장으로 직장을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삼남매는 광주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 쯤에 난 도시에서 취학을 하게 됐는데 시골 외가에서의 생활 탓인지 새벽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곤 했다. 우리 가족은 늘 한 방에서 같이 잤다. 난 여느 때처럼 요강을 찾으러 부엌 쪽으로 가는데 문 사이로 작은 전구 불빛과 함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슬며시 문틈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신 허리와 머리를 조아리며 손을 비벼대시는 모습을 보았다. 조그마한 아궁이 위에 작은 물 대접을 올려 놓으시고 주문을 외듯 또는 알 듯 말 듯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며 매일 새벽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것이었다.특별한 날이나 명절 때는 장독대나 골목 어귀에서 깊고 푸른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향해 주문을 외는 모습을 보곤 하였다. 외할머니의 그 모습과 똑같은 행위였다. 20여년이 흐른 뒤에야 나는 그 물대접이 무언지, 새벽이면 왜 주문을 걸었던지 알게 되었다. ‘정안수’는 깨끗한 물이다.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그 무엇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생명수이다. 게다가 모두가 잠들었다 서서히 깨어나는, 동이 움트기 직전의 정갈한 시간에 존재한다. 가장 숭고하고 간절한 열망을 모으는 행위의 공간도 제공한다. 그 그릇은 곧 고향이고 숙연한 마음이다. 이제 나도 중년이 되어 간절한 기도한 자락을 올린다. 푸른 새벽 하늘 아래 깨끗한 정안수 한 그릇 그려 놓고 천지신명께 기원한다. 건강하고 또 건강하시라고... 내 기억속의 ‘정안수’는 유년기의 외가와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이고 나아가 비손과 기도이며 신앙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담으려는 ‘정안수’는 어린시절 부뚜막에 웅크리고 앉아 아무도 모르게 새벽기도를 올리시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심정그것이다. -징검다리 27호(2009.5월 호)- |
|
| 2018-01-15 | 작가노트-아름다움과 진실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
아름다움과 진실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인간은 누구나 기원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다. 그것은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욕구일수도 있지만 인간은 인간본연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삶의 긴 여정이라고 본다. 그것은 한 개인 속에 자각되어지는 것들, 시간, 공간, 우주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현상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상태 일수도 있고, 자신의 기준점에 속할 수 도 벗어나기도 하며. 그 문제를 스스로 다스려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과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그리고 그 속에서의 나의 위치, 부분과 전체를 끊임없이 보아야만 하는 모습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욕구는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 일수 있지만, 이것 또한 우주 속에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은 양파를 벗기듯 또 다른 넓이와 깊이를 향해서 조금씩 전진하기도 후퇴하기도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찾아야 하는 모습들, 우리가 꿈꾸는 모습들 속의 단상들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상세계로 성장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싶다. 무엇이 있고 없는지, 의식적 무의식적 차이는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집착을 하게끔한다. 또 없음으로 인해 그 새로움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난 그 한 가닥의 빛을 찾아내고자 기원하고자하는 행위인 것이다. 하늘을 본다. 새벽녘의 푸른빛은 우리에게 무한한 깊이를 던져준다.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안겨준다. 내그림에서 뭐가 뭔지 모를 범벅에서 빛이 보인다. 암흑에서 푸르게 나아가 더 밝게 자리를 잡는다. 결국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전환된 느낌이다.이것이 나의 행위이고 내가 찾고자 하는 진실이것이다. 이처럼 유토피아를 기원하며 죽음과 태동이 내가 줄곧 풀고자 했던 화두다. 언뜻 이분적 사고라고 치부할 사람도 있겠다.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이 생멸이라는 근본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갖는 공감이겠다. 음양의 조화, 자연에의 순응, 파괴를 부르지 않는 순환에 무게를 두는 동양의 순환론적 사고의 표현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
|
ARTIST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