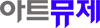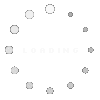| 2025-01-25 | 기억을 걷는 시간_작가노트 |
나의 작업을 지켜본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숨 가쁜 속도주의와 파괴된 고향과 자연 그리고 기후 교란이 생명을 위협하는 오늘날 박구환의 작품을 만나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하이데거는 시인의 사명은 귀향이며, 시를 짓는다는 것은 최초의 귀향이라고 하였다. 고향이란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구환은 우리를 생명의 환희가 흐르는 고향으로 데려가는 시인이다”
언젠가부터 나의 작품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섬마을 풍경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생명의 결실을 의미하는 화려한 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은 나의 고향이 섬마을 아니면 바다가 가까운 곳이 아닐까..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시골에서 보낸 몇 년의 유년기를 제외하고는 인생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보냈다. 작품의 소재로 섬마을과 바다를 다루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
작가로서의 삶이 몹시도 힘들었던 시기, 도피처로 찾았던 곳에서 만난 ‘바다’는마주하고 서 있으면 알 수 없는 평온으로 다가왔고 결국 작품의 소재가 되어 삶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또 ‘만개한 나무’는 십여 년 전 작업공간을 도심에서 담양수북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그전까지 작품 속, 나무는 하나의 배경에 불과했었는데 어느덧 화면 속 주인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가끔 관람객이 작품을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지명을 말하며 그곳이 아니냐고 묻곤 한다. 그들이 기억하는 특정지역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그리운 곳으로의 여행을 다녀온 그들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정도 긍정도 아닌 대답을 할 때가 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들이 가고 싶은 그곳으로 이미 가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굳이 고백하자면 나의 작품 속 풍경은 누구나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고향도 아니다. 선명하지만 흐릿하고, 흐릿하지만 선명한 유년의 추억이다. 결국 나에게 고향이란,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풍경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본바탕의 감성이며 그곳의 향기, 색상과 형태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들리는 소음들까지 정겹게 느껴지는 곳이다. 그래서 나의 작품 속 고향이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익숙하고 정겨운 감각들을 되살려 내기를... 그렇게 담담하게 전해지는 삶의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
|
| 2025-01-25 | "소리의 바다"(Sea of Sound) 시리즈 |
"소리의 바다"(Sea of Sound) 시리즈 잘 나가는 작가, 비전이 밝은 작가로 바쁜 그이지만 한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던 때가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을 때 이야기다. 정말 열심히 작업했었다. 공모전에도 출품한 지 수년 안에 대상까지 석권해 공모전 초고속 졸업이라는 레테르를 달기도 했다. 작업을 뼈빠지게 했다. 그렇게 공모전 추천작가가 되고 초대작가가 되면 무엇하랴,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고 생계유지조차 힘든데…
참 답답했다. 그래서 배낭하나 걸쳐메고 남도 해안을 주유했다. 이른바 강태공이 따로 없었다.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때론 두 세달도 좋았다. 움직임없이 낚시를 드리운채 바다만 응시했다. 그렇게 물고기를 낚던 그가 어느날 거기서 시를 퍼올렸다. 그렇게 퍼올린 시를 판화로 형상화해낸 것이 "소리의 바다"(Sea of Sound)다. 왜 "바다의 소리"가 아니냐는 질문에 빙긋 웃는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바다가 아니랍니다. 대자연의 소리가 내 귀바퀴를 간질렀고 그 다음 소리가 엷어지는 순간 두 눈이 활짝 열리면서 대자연이 내 두 동공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청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그 순간의 감정을 박구환은 계속해서 설명한다. 밤새워 낚시를 하노라면 갯돌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귀에 쟁쟁거린다. 바다가 계속해서 토해내는 그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고 나중에 별 감각도 없어질 무렵 먼동이 트고 소리는 그대로 있는데도 엷어져간다. 그 순간 확 달려드는 자연이 눈으로 몰리고 시각적 트임의 자각을 얻게 됐다고. 밤새 청각에 시달린 후 아침이 돼 눈이 열릴 때면 환희 자체였다. 더구나 남도의 능선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운 풍경의 숏이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어디다 숏을 치고 라인을 그어야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평범한 풍경이 되는가가 분별됐다. 모두 청각의 전쟁 끝에 거둬들인 성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청각이 시각으로 옮겨가면서 눈을 통해 거둬들인 것이 눈만을 통해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소리의 바다"다. 그것은 멈춤과 머물러있음, 아니면 느리게 가기를 통해 그가 얻어낸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 지쳐 울다가 고꾸라질 수 없다고 여기고 바닷가로 갔고 거기서 느림의 실천 속에서 옭아맸던 족쇄를 풀었다. 그리고 자연 깊숙이에서 시를 퍼올려 낸 것이다. 그의 판화 "소리의 바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시의 형상화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울림이 크다.
|
|
| 2025-01-25 | 가장 한국적인 풍경이고 정취가 넘친다 |
가장 한국적인 풍경이고 정취가 넘친다 착한 풍경을 자신의 판화에 집어넣은 계기다. 착한 풍경이 답답하기도 했다. 공모전을 치르면서 비구상적인 판화를 하다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서정적인 풍경을 넣자니 작업하면서도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그 답답함에 대한 굴레를 2004년 미국 뉴욕 전시회를 통해 벗어던졌다. 처음 해외전을 나가면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현대 미술의 본고장인 뉴욕에서 바다 풍경이 펼쳐지는 시골스러운 판화를 내놓는다고 생각하니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응은 아주 좋았다. 거기서 박구환은 희망을 보았다. 현지 미술평론가들과 언론은 "가장 한국적인 풍경이고 정취가 넘친다."며 그 평화로운 풍경의 컨셉에 박수를 보내주었다. 현대 미술의 휘몰아치는 뉴욕미술계에서 구태의연한 풍경이 통한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 그러나, 박구환의 작업을 처음 본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며 이게 판화냐고 놀라지만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이들은 답답해했다. 10년 넘게 변화없는, 비슷한 경향의 작업에 종지부를 찍고 변화를 은근히 기대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변할 순 없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테크닉의 완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의 욕심에 휘말려 내던지고 다른 것으로 옮겨가기는 싫었다. 누가 뭐라건 한없이 머무는 듯 싶었다. 테크닉이 절정에 오르지 않았다는 생각에 얼마나 열심히 찍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10여년 동안 300여점을 전시했다. 물론 그 중엔 전시되지 않고 보관 중인 작품도 상당수다.
|
|
ARTIST NOTE